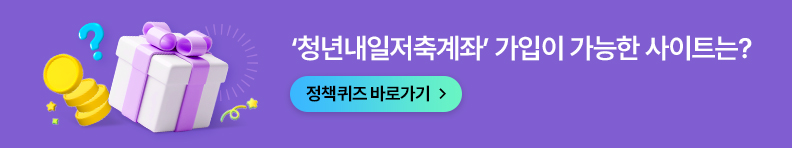-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일본 수출규제 1년…잠자던 한국 소부장 산업을 깨우다
 |
|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수출 심사를 품목 개별로 받아야 하며 최장 90일이 소요되게 됐다.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반도체 에칭 공정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는 일본의 스텔라케미파, 모리타화학공업(액체 불화수소)과쇼와덴코(가스), 반도체 패터닝 공정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는 JSR과 신에츠케미칼, 폴더블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의 스미토모화학에 의존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정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은 합심해 공급체 다변화(Vendor 다변화)와 국산화를 빠르게 추진했다.
그로부터 1년 후, 2020년 7월 현재 국내 S사 및 R사에서는 불화수소 케미컬에 대해 일본산과 동일 수준의 순도를 확보해 국산화 및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불화수소 국산화의 노력으로 반도체 소자 업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서 국산 불화수소 케미컬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텔라케미파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30% 이상 급감했으며 모리타화학공업 또한 판매량이 30% 이상 급감하는 피해를 받게 됐다.
S사와 F사에서는 불화수소 가스에 대해서도 고순도 성능을 확보했으며 양산 및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D사는 ArF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자 업체에서는 신에츠케미컬, JSR 뿐 아니라 TOK, 듀폰 등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K사와 S사에서는 플로오린 폴리이미드의 독자기술을 확보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산을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오히려 지난 15년간 정체됐던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력은 현재 진행형이며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단일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미·중 무역 전쟁, 한·일 갈등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IT의 패권 전쟁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IT 밸류 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2025년까지 반도체의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제조2025’ 대응책 중 하나이다.
향후 심화될 IT 밸류 체인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지속적인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글로벌 IT 밸류 체인이 흔들렸으며, 특히 일본으로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50% 이상을 수입하는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회사는 초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의 SUMCO 및 ShinEtsu(실리콘 웨이퍼), HOYA(마스크), 스텔라케미파 및 모리타화학공업(불산)의 생산에 영향을 끼쳤으나,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의 재고 확보 및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대지진 후 밸류 체인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jpg) |
|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상공회의소에 차려진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회의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오히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의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지난 기회를 놓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10년간 국산화가 정체됐으며, 여전히 일본 업체를 비롯한 소수의 소재·부품·장비 공급처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았다. 지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모든 품목에 대해 국산화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은 기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국산화에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국산화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기술 개발의 시급성, 기술의 난이도, 시장성을 모두 고려해 국산화 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발생된 일본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의 제품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국내 공장 유치 등을 통한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산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사업의 적극 추진, 해외기업의 R&D 센터 및 생산기지 유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R&BD 자금 지원 및 환경 규제 해소, 대기업의 기술적 지원, 그리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지원을 동반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