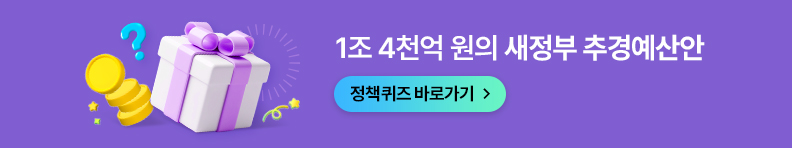-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책임감 있는 노동운동이 아쉽다
 |
|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
9월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맹이 파업을 벌였고 철도파업은 벌써 3주째로 접어든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성과연봉제란, 복잡한 임금 구성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단순화하고 성과에 따라 성과연봉 부분을 조절해 열심히 일하면 더 벌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폐해만 불러온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금의 공공부문이야말로 비효율성으로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싫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화물연대도 파업에 가담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중 소형화물차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간 택배 물량이 27배 증가하면서 차량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차량 공급을 늘리면 본인들 운임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파업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단순히 노조와 사용자 간의 힘겨루기를 넘어 국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라는 점이다.
필자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감안해 추정한 결과, 이번 파업들이 한 달간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약 4조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힐 전망이다. 이 수치도 현대차가 파업으로 생긴 생산 차질의 70%를 연말까지 만회하고, KTX나 화물열차도 현재 운행률 이상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다. 게다가 화물연대 파업은 감안하지도 않았다. 이 정도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이상 낮출 규모다.
이번 파업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본인들의 파업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평균 연봉 9600만 원을 받는 현대차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이 더욱 양극화되고 국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 청년실업이 더욱 심화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본인들의 임금에만 관심이 있다.
철도노조나 화물연대도 화물 운송 차질로 시멘트 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졌고 지난 21개월 중 20개월 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달 10일까지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31% 감소하고 자동차 수출은 무려 52% 감소한 것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 오로지 성과 평가라는 경쟁이 싫고 자신들의 운임이 낮아질 가능성 자체가 싫은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노조의 힘은 엄청난 속도로 커졌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조는 더더욱 그렇다. 그만큼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졌으면 사회적 책임감도 커져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의 파업에서는 성숙한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책임감은 전혀 없다. 오히려 강자의 폭거라는 느낌뿐이다.
일본 닛산노동조합연합회 다카쿠라 아키라 회장은 “일본 국내 생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만 닛산뿐만 아니라 부품업체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노사 협의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마음으로 되새겨야 한다. 회사와 국가경제를 빼고 나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