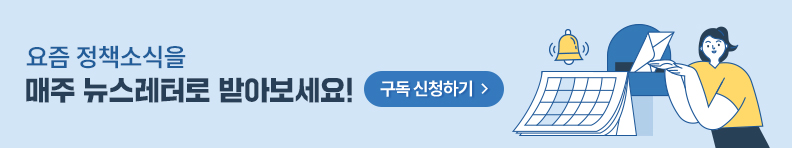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우리 시문학사에 휘황한 횃불을 밝혀든 목가시인”
사는 것이 팍팍하고 허허로울 때 시를 한편 읽으면 좋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믄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아래 사는 나의 거룩한 일과이어니…’
신석정의 시 <들길에 서서>의 부분이다.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으니, 사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저믄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슬퍼도 좋은 이 대목에서 신맛이 난다. 이 시를 읽어서 배가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가물어 바짝 타는 논에 물이 흘러드는 것처럼 촉촉해지는 것이 좋다.
전북 부안 읍내에 ‘석정 문학관’이 있다. 그 옆으로 그가 ‘슬픈 목가’를 썼던 고택, 청구원이 있다. 부안의 유명한 백합죽을 한 그릇 먹고 느릿느릿 돌아보면서 근처 ‘매창공원’까지 다녀오면 좋을 일이다.
신석정(1907∼1974)은 이름이 석정(錫正)이고, 칠석에 낳았다 해서 호도 석정(夕汀)이다. 어려서 한학을 했다. 조부는 시우(詩友)를 데려와 긴 두루마기를 펴 놓고 한시를 쓰면서 술잔을 기울이곤 했는데 그때의 향긋한 묵 내음, 내가 시를 쓰게 된 기질은 이 묵 내음에서 배어든 것인지도 모른다고 석정은 수필(1959)에서 쓰고 있다.
보통학교 6학년 때, 수업료를 미납한 한 학생을 발가벗겨 울타리 밖으로 내쫓고는 기어서 들어오라는 일본인 선생에 반발하여 4백여 명의 학생들을 선동, 동맹휴학을 일으킨 일로 무기정학을 당했던 일화가 전한다.
그는 1924년 18세에 시 <기우는 해>를 조선일보에 발표했다. 1930년 중앙불교전문강원(동국대 전신)에 입학하여 스승 박한영대종사 문하에서 불전을 공부했다. 승려의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 환향을 고대하는 아내와 어린 것들이 어른거려 단념하고 시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1931년 ‘시문학’에 시 <선물>을 발표하고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문학적 성장을 이룬다. 시문학은 1호 박용철·김영랑·정지용·정인보·이하윤에 이어 2호 변영로· 김현구, 그리고 3호에 신석정이 등장한다.
그는 1933년 귀향한 뒤 손수 초가삼간을 지어 청구원이라 이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창작에 전념했다. 이곳에서 첫 시집 ‘촛불’과 두 번째 시집 ‘슬픈 목가’를 집필했다. ‘
촛불’이 상재되었을 때 김기림은 “우리 시문학사에 휘황한 횃불을 밝혀든 목가시인”이라고 평했다. 1930~40년대 우리문화의 암흑기였던 그 무렵, 그의 시 ‘차라리 푸른 대’는 일제의 검열에 걸려 ‘문장’지에 실리지 못했다. ‘蘭(란)아/… 벙어리처럼 목 놓아 울 수도 없는 너의 아버지 나는/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竹)로/ 내 심장을 삼으리라’
그는 ‘국민문학’에서 일본어로 친일시를 써 달라는 원고청탁 용지를 찢어 던지며 해방 때까지 절필했다. 그는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했고, 단 한편의 친일시도 남기지 않았다. 1930년대 우리 시인 가운데 석정처럼 친일로부터 한 오점도 없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 군부독재의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때로는 목가적인 촛불을, 때로는 시대에 저항하는 횃불을 들면서 시인으로서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당시 교원노조를 지지하는 시 <단식의 노래>를 발표했으며 혁신계 신문 ‘민족일보’에 <다가온 춘궁>을 발표해 남산으로 연행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의 제자인 허소라 군산대 명예교수는 “석정을 전원시인, 목가시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친일과 반공의 시대 허물 있는 사람들의 편견”이라며 “시 정신이 없는 민족과 국가는 흥할 도리가 없으며 시 정신의 바탕은 신념이고 그 신념은 지조라고 말한 석정은 참여시인이며 저항시인이고, 그것은 그의 삶의 궤적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평했다.
높은 산의 의연함과 흐르는 물의 자재함에 뜻을 둔다는 ‘지재고산유수(志在高山流水)’는 석정의 평생 좌우명이었으며, 그의 삶 또한 그러했다. 문학관 내벽에는 이 자구가 새겨져 있고, 그의 친필 서예작품으로도 소장되어 있다. 그는 전북대에서 시론을 강의하기도 했으며 전주고, 김제고 교사를 지냈고 1972년 전주상고에서 정년했다. 1956년 세 번째 시집 ‘빙하’가, 1967년 네 번째 시집 ‘산의 서곡’이, 1970년 다섯 번째 시집 ‘대바람 소리’가 출간됐다. 그는 1973년 전북문화상 심사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리고 200여일 간의 긴 투병을 마치고 이듬해 향년 예순여덟의 생을 마쳤다.
‘백목련 햇볕에 묻혀/ 눈이 부시어 못 보겠다// 희다 지친 목련꽃에/ 비낀 4월 하늘이 더 푸르다// 이맘때면 친굴 불러/ 잔을 기울이던 꽃철인데// 문병 왔다 돌아가는 친구/ 뒷모습 볼 때마다// 가슴에는 무더기로 떨어지는/ 백목련 낙화소리’
<가슴에 지는 낙화소리>라는 제목의 이 시는 병상에서 쓴 그의 마지막 시다. 2012년 석정문학관이 개관됐고, 매년 이곳에서 ‘석정문학제’가 열리고 있다.

◆ 이광이 작가
언론계와 공직에서 일했다. 인(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애인(愛人)이라고 답한 논어 구절을 좋아한다.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이 주업이다. 탈모로 호가 반승(半僧)이다.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