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AI 시대, 일 잘하는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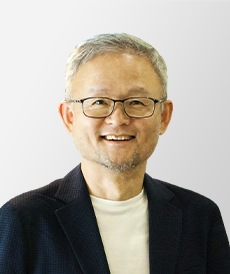
데이터는 D 드라이브에
"그 자료 어디 있어?"
"김 과장이 갖고 있습니다."
"가져와 봐"
"김 과장 어디 갔어요?" "서울 올라갔는데요?" "아 큰 일이네, 국장님이 지금 자료 찾으시는데" "잠깐만요, 전화해 볼게요." "김 과장님 국장님이 그 자료 찾으시는데 컴퓨터 비번 좀 불러주세요." "D 드라이브 어느 폴더에 있어요? 아, 찾았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AI)이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잠재된 패턴을 찾아낼까?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렇게 한다.
맞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AI는 똑똑해질 수 없다. 과적합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가령 주사위를 세 번 굴렸는데 세 번 다 6이 나왔다고 하자. 그때 '이 주사위는 6이 많이 나와요'라고 하는 게 과적합이다. 너무 적은 데이터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다. 제대로 만든 주사위라면 천 번쯤을 굴려보면 1부터 6까지 비슷한 확률로 수렴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나? D 드라이브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수명을 다해 포맷될 때 함께 사라진다. 숱한 맥락이, 암묵지가, 과정이 포맷과 함께 사라진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장차 써야 할 인공지능의 미래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함께 포맷된다.
자간·장평, 1페이지 보고서
높은 사람에게 올라갈 보고서일수록 짧아져야 한다. 1페이지가 선호된다. 연차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1페이지 보고서를 능숙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자랑한다.
"그게 '짬'이지!"
자간과 장평을 귀신같이 다루는 것도 물론이다. 끝에 한 글자가 흘러넘쳐 줄을 바꾸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뒤 페이지로 두 줄이 넘어가는 것도 치욕이다. 아래아한글에는 아예 공무원만 쓰는 전용 폰트가 따로 있을 정도다. 문장은 모두 개조식이다. 음슴체다.

세상에서 가장 일을 잘한다는 실리콘밸리에선 어떻게 할까? 세계 최고의 AI를 만들고 있는 곳들도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바쁜' CEO에게 반드시 1페이지 보고서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을까?
'6 페이저(6 Pager)'라는 게 있다. 아마존의 회의 규칙이다. 아마존에선 구성원 모두가 6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작성해 회사와 공유하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한다. 당연히 완전 문장으로 서술체로 쓴다. 회의에 참석하면 참가자 전원이 첫 30분간을 이 메모를 읽는 데 쓴다. 그러고 나서 회의를 한다.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참석하는 회의라고 예외가 없다. 실은 베이조스가 만든 규칙이다.
'6 페이저'의 구조는 도입부, 목표, 원칙, 사업 현황, 교훈, 전략적 우선순위, 부록으로 이뤄진다. 목표와 원칙을 맨 앞에 정리함으로써 길을 잃지 않게 만든다.
'음슴체'와 유사한 게 아마도 파워포인트로 만든 보고서일 것이다. 아마존, 링크드인 등 많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사내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금지하고 있다. 파워포인트(PPT)를 금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베이조스는 "파워포인트는 판매 도구다. 내부적으로는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판매하는 것"이다며 "파워포인트의 불릿 포인트(글머리 기호) 뒤에는 많은 엉성한 사고를 숨길 수 있다. 서술 구조를 가진 완전한 문장을 써야 할 때는 엉성한 사고를 숨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4페이지 메모를 쓰는 것이 20페이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는 메모의 서술 구조가 더 나은 사고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강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보고일수록
클라우드를 써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협업 시스템은 클라우드를 기본으로 한다. 위키 엔진을 기반으로 한 게시판을 주로 쓴다. 모든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대개 재무와 인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서가 게시판을 공개로 설정해 두고 있다. 구글에 입사한 개발자는 첫날부터 회사의 핵심 자산인 검색엔진의 소스코드를 들여다볼 수 있다.
게시판을 공개로 하면 모든 참가자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생긴다. 그간의 모든 논의 과정과 자료가 다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문서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맥락'을 공유할 수 있다. 문장(text)이 아니라 문맥(context)이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다른지는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를 쓰고 게시판을 공개로 두면 내가 만든 모든 자료, 내가 검토한 모든 참고 자료가 고스란히 조직 내에 쌓이게 된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좋아할 일인가!! 인공지능에 파편화된 문장만 마지못해 주는 조직과, 모든 맥락과 검토에 사용한 참고 자료까지 넘겨주는 조직 사이에서 인공지능의 지능 격차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라!
1페이지 요약을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 소요 시간을 생각해 보자. '6 페이저'를 받은 사람과 1페이지 요약을 받은 사람의 전체 효율을 생각해보면 '6 페이저'가 압도적으로 나을 거라는 건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보고서를 읽는 시간과 전체 업무시간, 업무의 효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언제나 총소유비용(TCO)을 생각해야 한다. 잉크젯 프린트를 싸다고 덜렁 샀다가 잉크값으로 돈이 줄줄 새는 것과 마찬가지다. 1페이지 보고서는 잉크값이 다락같이 비싼 싸구려 잉크젯이다.
주요한 결정이 필요한 보고서는 반드시 서술체로 작성해야 한다. 음슴체는 '많은 엉성한 사고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술 구조가 더 나은 사고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강제'한다. 무엇보다도 음슴체보다 서술체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맥락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데 백만 배 낫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훨씬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쓸 자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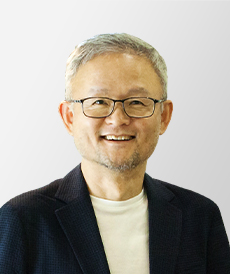
◆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KTH, 엠파스 등 IT 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며 현재 녹서포럼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T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저서로는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등이 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