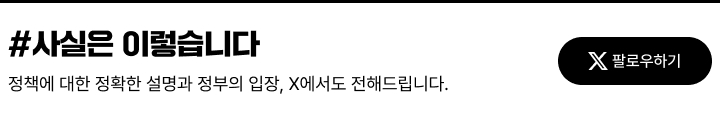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아니냐’는 주장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D의 공포가 추가 금리인하 부추겨, 침체 지속 땐 제로금리 전망도’<서울경제> ‘성장 꺾이고 디플레 우려까지…한은, 투자·소비 살리기 안간힘’<매일경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황은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물가수준의 하락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상품 및 서비스 가격하락과 함께 경기침체가 동반해서 나타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1990년대부터 이어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사례 모두 성장과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주식과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기침체 국면으로 급속히 진전됐습니다.
(1)최근 물가하락은 ‘수요 둔화로 야기되는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보면, 올해 초부터 0%대 중반을 기록하다가 8월 0%, 9월에는 –0.4%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0.4%(3월)→0.6%(4월)→0.7%(5월)→0.7%(6월)→0.6%(7월)→0.0%(8월)→-0.4%(9월)
그런데 이런 물가상승률 하락의 주요인은 ‘일시적인 공급측 요인’에 있습니다. 작황이 좋았던 농산물가격 하락과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석유류 상품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농산물 가격은 폭염으로 작황이 나빠 14.9% 상승했지만 올해 9월에는 풍작으로 13.8% 떨어졌습니다. 또 석유류 가격은 작년 9월 배럴당 77달러에서 올해 9월 배럴당 51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에 크게 기여(0.95%p)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요인도 물가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9월에는 고교 납입금이 36.2%, 학교급식비가 57.8%, 병원검사료가 10.3%, 보육시설이용료도 4.3%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하락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계비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있습니다.
(2)근원물가는 연초부터 1% 내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실제 경제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농산물 작황이나 국제유가의 등락으로 인해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가의 기초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을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근원물가는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농산물,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원물가는 9월에 0.6%를 기록하며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연초부터 1%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지난해 물가지수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점도 영향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동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난해 물가가 대폭 오르면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는 ‘기저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품목의 물가하락, 즉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5.65(2015년 기준 100)이고 올해 9월 지수는 105.20이므로 전년동월에 비해 0.4%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의 물가지수가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어떤 수준이었는지 살피지 않고 디플레이션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018년 9월과 10월의 물가지수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점을 떠올려보면 올해 10월도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최근 물가하락이 농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요인과 정부 복지정책 강화 등 정책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 근원물가가 1% 안팎을 유지하는 점, 전년동월의 높은 물가수준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년에는 다시 1% 내외의 물가상승률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