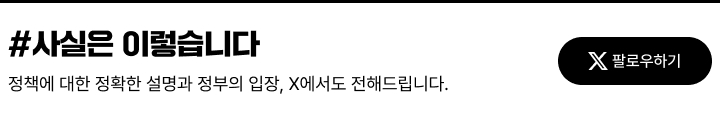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자 매일경제 <세월호·메르스·AI, 판에 박은 듯 5가지 실패 공통점>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지난 10월 28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최초로 AI 검출 후 11월17일 농장에서 AI 확진까지 19일간 인근 지역 방역이 안되고, 수리 부엉이 20일만에 확진’에 대해 “AI가 확인되기 이전인 10월1일부터 철새 도래시기에 맞추어 AI 방역 상황실을 설치·운영했고 10월 28일은 연구목적으로 한 대학이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채취한 시점으로 AI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11월10일 해당 시료에서 AI를 확인한 즉시 충남도로 하여금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채취지점으로부터 10km까지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16일 전남 해남에서 AI 의심신고를 받고 역학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고 17일 농식품부장관은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참석, 총리에게 AI 의심축 방역추진 상황을 보고했으며 같은날 고병원성 AI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지자체, 관련 부처 등에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는 등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대처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리부엉이는 11월 16일 검역본부에 검사 의뢰돼 23일에 확진되었으며 검사기간은 7일로 늦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부실한 대응 매뉴얼 지적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AI를 포함한 가축전염병은 발생 상황과 특성이 매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방역당국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AI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긴급행동지침)에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일례로 2개 시·도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전국 이동제한 실시로 규정하면 각각의 시·도에 1건씩만 AI가 발생해도 전국에 걸쳐 이동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력과 관련해서는 “AI 발생 직후 AI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를 설치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컨트롤 타워를 가동했고 발생 초기부터 관계 부처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회의(11.22), 관계차관회의(11.23), 민생안정회의(11.25), 경제장관회의(11.30) 등을 통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가동해 왔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3년째 철새 탓만 하고 책임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AI 유전자 분석 등 역학조사 결과에 의거, 철새를 통해 AI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며 일본·미국 등 해외 정부들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I 예방통제센터는 현장 방역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서 설치·운영해 왔다”면서 “향후 관계 부처가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AI 예방통제센터의 개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044-201-2377)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