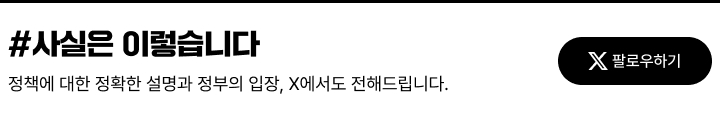환경부는 11일자 중앙일보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억…‘화평법’에 중소기업 ‘억소리’>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등록비용은 물질당 평균 1억 1590만원, 몇 개 중소기업이 공동등록협의체를 구성해 n분의1로 부담을 줄였는데도 이 정도’라는 지적과 관련, “기업이 주장하는 등록비용과 실제 등록비용은 차이가 크다”며 “등록비용은 물질별로 다를 수 있으나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경우 시험자료 확보 비용은 기업당 100만∼670만 원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례로 등록이 완료된 A 물질(유통량이 1000톤 이상)은 시험항목이 47개로 등록비용이 당초에는 6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시험항목 면제, 국외 비시험자료 활용 등으로 시험자료 확보 비용이 1개 기업당 46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등록대상 물질 510종 중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71종(13.9%)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질별 유해성자료 생산·제공, 공동 자료등록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2015년부터 등록대상 510종 물질의 협의체 구성, 유해성자료 확보방법, 위해성 자료 등 등록신청서류 작성 등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해성자료생산 지원의 경우 환경부는 “2015년에는 38종 물질 306개 시험자료, 2016년에는 37종 물질 222개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해 기업에 제공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올해에는 중소기업 수가 많은 협의체가 등록해야 하는 14종 물질에 대해 고가의 시험항목을 생산하는 등 시험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생산한 자료는 생산 비용의 3% 수준의 저가로 중소기업에 제공한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251종 물질의 975개 시험자료에 대해서도 기업에게 저가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 자료등록 지원의 경우 환경부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이 제조·수입하는 54종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시험자료 확보, 위해성 자료 작성, 등록 신청 등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컨설팅을 실시한다”며 “올해도 추가적으로 70여 종의 물질에 대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협의체 및 기업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학물질 등록절차와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 가운데 현재까지 중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376종(74%)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머지 134종도 현재 협의체 구성 중이거나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으로 당초부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업이 화학물질을 환경부에 등록하려면 최대 47종의 유해성 자료 첨부, 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시험기관이 발급한 것만 허용해 막대한 비용’ 지적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은 대부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하로 이 경우 15개 항목의 시험자료만 제출하면 된다”며 “등록 시 필요한 자료는 보도내용과는 달리 비시험자료가 대부분으로 실제 시험기관에서 생산해야 하는 항목은 약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는데 국내에는 6개 뿐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을 대행하는 컨설팅업체는 6개가 아니라 15개로 파악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물질등록 지원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컨설팅사 간담회 등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EU의 등록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시행됐다.
이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이나 폐질환과 같이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기업이 미리 파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즉,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및 등록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기업에 부과된 최소한의 책임이다.
다만, 국내에는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이므로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