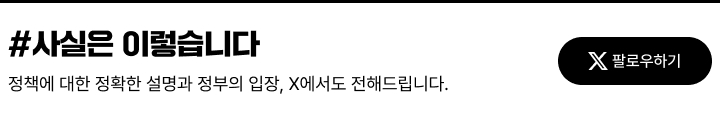환경부는 23일 TBC에 보도된 수돗물 중 과불화화합물 관련 <환경부 축소·은폐 비판> 및 <시민들은 몰라도 된다?…배출원도 쉬쉬> 제하 기사 관련 “환경부가 축소·은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미규제 미량물질인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7년 4월 ‘과불화화합물 14종과 의약품 46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 정수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올해 4월 30일 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과불화화합물 측정결과 검증 차원에서 재검사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은 후 지난 5월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낙동강 수계 18개 정수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배출원 확인과 차단조치를 실시해 6월 12일 완료했다.
연구용역은 과불화화합물 검출 추세 확인을 목적으로 낙동강 수계 5개 정수장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과불화화합물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관리하기로 발표했다.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 중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된 과불화옥탄산(PFOA)은 검출수준이 권고기준을 설정한 세계 어느나라 기준보다 낮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매곡정수장은 0.004㎍/L, 문산정수장은 0.004㎍/L로 캐나다 0.6㎍/L, 독일 0.3㎍/L, 호주 0.56㎍/L 등 외국의 권고기준보다 낮았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은 사람이 하루 2리터씩 평생 마셔도 문제없는 수준의 농도로 설정되기 때문에(WHO 및 외국도 마찬가지) 특정 물질의 검출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항목중 20개가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으며 예를들어 납 0.01㎎/L, 포름알데히드 0.5㎎/L 등(우리나라 수질기준은 WHO 및 선진외국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이다.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검출농도가 증가한 것과 관련, 외국 권고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사전예방차원에서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저감조치(배출원 차단 포함)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검출수준(매곡정수장의 경우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0.126㎍/L)은 호주(0.07㎍/L)보다는 높으나 캐나다(0.6㎍/L)와 스웨덴(음용제한 기준 0.9㎍/L(11종 총합))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권고기준이 0.07㎍/L이나 이는 사람의 하루 섭취허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수준(나머지 90%는 음식이나 제품 사용과정에서 섭취)이므로 0.07㎍/L 초과가 바로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섭취허용량(TDI; Tolerable Daily Intake)이란: 사람이 그 정도의 양은 평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수준의 양을 말한다.
과불화화합물은 외국 문헌을 보면 활성탄이나 역삼투압(RO) 방법으로 원수중의 농도를 9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정수장 관리 지자체에 분말활성탄을 즉시 투입해 정수장에서 저감조치를 취하도록 지난 5월 29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스웨덴, 영국, 독일 등도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음용제한 기준’과 ‘행정적 저감조치 기준’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 스웨덴(PFHxS 포함 과불화화합물 11종 총합)
- 저감조치 기준 : 0.09㎍/L
- 음용제한 기준 : 0.9㎍/L
◇ 영국(PFOA) : PFHxS에 대한 권고기준 없음
- Tier 2(0.3㎍/L 이상인 경우) : 모니터링 수행 및 전문가 컨설팅
- Tier 3(5㎍/L 이상인 경우) : Tier 2 + 현실적 방안으로 5㎍/L 이하로 저감
- Tier 4(45㎍/L 이상인 경우) : Tier 3 + 7일 이내 먹는물 노출 감소방안 수립 및 긴급 전문가 컨설팅
아울러 환경부가 라돈 감시항목 지정으로 과불화화합물 관심을 희석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두가지 내용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통합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외국의 관리추세와 국내의 사용실태 등을 토대로 법정 수질기준이 아닌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돈에 대해서는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상반기에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을 2017년 12월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국내에서 라돈 이슈가 부각되기 이전인 2018년 4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감시항목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사업장이 배출허용 기준을 지켜야하는 규제대상 수질오염물질이 아니라 아직까지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규제물질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2018년 현재 페놀 등 55종이 지정 관리 중이다.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 배출사업장은 환경부가 배출사실 통보 후 자발적으로 즉시 원인파악에 착수해 배출되지 않도록 차단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업명 공개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미규제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고 해당 기업이 관련 사실을 인지시 자발적으로 저감조치를 완료했으며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행정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기업명을 공개하는 것은 행정상 기본원칙인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소침해의 원칙이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피해가 가장 작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5일 수돗물 수질전문가 및 보건위생 전문가 등과 함께 현지 정수장을 방문, 환경부차관 주재로 현장점검 및 활성탄 정기교체 의무화 등 정수장 수질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부 수도정책과/수질관리과 044-201-7116/7071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