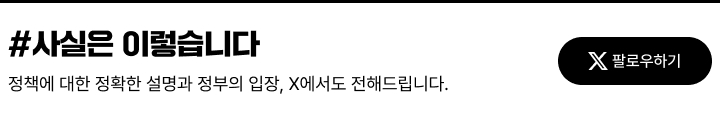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만을 순수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료비·물가·수요증가효과 등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수요·연료비 증가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총 전력구입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17년 대비 2022년에는 1.3%, 2030년에는 10.9%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① 전력구입비를 전망할 때 전력수요 증가 영향을 배제하고 2030년 전력수요가 2017년과 같다고 가정하였으며, 연료비, 물가 상승 효과도 모두 배제
② 전력구입비를 전망할 때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19.5% 하락‘(장기계약효과를 반영안하면 35.5% 하락)한다고 가정하였는데, 풍력·바이오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도 모두 태양광만큼 단가가 떨어진다고 가정
③ 전기요금 상승률을 산정할 때 전력구입비 증가율만을 구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송배전 건설비를 제외하여 과소 추계
[산업부 입장]
①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만을 순수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료비·물가·수요증가효과 등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
ㅇ 연료비나 물가는 에너지 전환과는 전혀 무관한 요인
ㅇ 또한,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에너지전환과 무관하게 총 전력구입비가 늘어나므로 이러한 효과를 배제한 것이지, ‘30년 수요를 ’17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거나 수요증가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님
ㅇ 작년 12.27일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르면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할 경우 ‘17년 대비 ’22년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1.3%, ‘30년에는 10.9%임을 이미 밝힌 바 있음
②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 태양광 단가를 기준으로 전망하였음을 명시한 바 있음
ㅇ 이는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중 가장 비중이 크고, 국내외에서 발전단가에 관한 연구와 실적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임
*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 태양광 36.7, 해상풍력 27.3, 육상풍력 9.6
- 그에 따라 모듈가격은 해외기관 전망치, 비모듈 가격은 우리나라 과거 실적 비용을 반영하여 추정한 전기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 35.5% 하락한다는 전망을 활용하였음
- 참고로, 해외에서도 ‘17년 대비 ’30년 태양광 발전단가가 블룸버그는 66.8%,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59% 하락한다고 전망하였음
ㅇ 반면, 해상풍력의 경우 국내 설치 실적이 거의 없어* 국내 여건을 고려한 미래 발전원가 추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17년 재생에너지에서 해상풍력 비중 : 0.24%(30MW)
- 따라서 해외 주요기관이 해상풍력 발전원가를 ‘30년까지 30~4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고려하여, 태양광 단가를 활용한 것임
③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송배전 설비 투자비용이 일률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ㅇ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되면 계통 보강비용이 증가하게 되지만, 반면 원전 등 대규모 기저발전 설비의 건설이 줄어들게 되어 송배전 설비투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044-203-5262)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