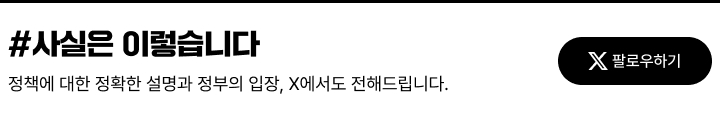환경부는“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안전을 위해 지켜야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장 건설 자체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용·시험용 시약은 수입신고와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시범생산용 시설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신소재 개발 진흥을 위한 다양한 특례를 마련·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담보하면서도 반도체 소재 관련 국산화 노력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에 따른 인·허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중소·영세 기업에 규제이행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 내용]
7일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는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환경 규제로 인해 국내 생산이 쉽지 않음, △ 업계에서도 에칭가스 자체 생산 포기를 권유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함
또한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국내 재료 회사에 대해 기술력·비용 등을 이유로 기술지원에 대해 소극적이고, 차세대 재료에 대해서는 함께 개발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환경부 설명]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안전을 위하여 지켜야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장 건설 자체를 제한하는 법이 아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취급시설이 갖춰야 할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사고 시 사업장 밖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장외영향평가서)를 마련함
2015년 이후에도 많은 업종에서 공장 신·증설 등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은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은 줄고 있음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 안전기준, 전문인력 등 화관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8,222개소(2014.12월)에서 14,676개소(2018.12월)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화학사고는 113건(2015년)에서 66건(2018년)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또한 환경부는 소재 개발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례 적용 중
연구용·시험용 시약(유독물질,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신고·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으로 취급(사용·보관·운반·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제조시설에서 새로운 제품을 시범생산 할 경우 물질변경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기업이 보다 손쉽게 실험·연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반도체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인 요인에 근거함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 제작시 안전·오염 관리 노하우 부족으로 기술 확보가 필요한 상태이며, 생산설비가 모두 일본제로 전량수입에 의존 중
아울러, 반복된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지역 우려·민원 증가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합리적·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신·증설을 인·허가하고 있음
* (예) 충남 R사(액상불산 취급업체)의 경우 ’14~‘16년간 3차례 불산 누출사고 발생
환경부는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담보하면서도 반도체 소재 관련 국산화 노력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에 따른 인·허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중소·영세 기업에 규제이행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0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