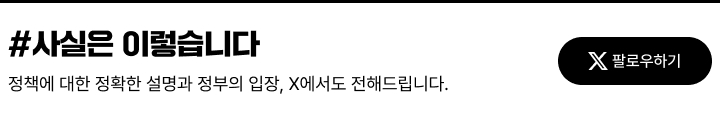보건복지부는 “기사에서 제시한 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자는 급여비 충당부채까지 고려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에 따른 것으로, 실제 현금 지출을 기준으로 한 현금수지 적자 규모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관리가능한 범위 내의 적자 수준으로,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재정 관리를 강화해 2023년에도 재정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급격한 고령화·문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4조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제시한 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적자(4조 2000억 원) 규모는 급여비 충당부채*까지 고려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에 따른 적자로 실제 현금 지출을 기준으로 한 현금수지 적자 규모와는 다릅니다.
※ 급여비 충당부채는 의료기관이 진료 후 당해년도 급여비 미청구분(향후 급여비 지출 예상액)을 추정하여 결산에 반영하는 부채로
- 의료기관이 다음연도에 급여비를 청구하여 급여비가 지급되면 즉시 소멸하는 부채이므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 누적되는 부채가 아님
- 공공기관은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 방식에 따른 재무 전망을 실시하여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금수지 : 당해 실제 현금 입출금 현황을 나타내며, 입출금 증감내역을 당기수지로 표시
◈ 결산수지 : 현금 입출금과 관계없이 당해 수입·지출 원인이 발생하면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인식·반영하여 당기순이익으로 표시(현금수지와 달리 급여비 충당부채 및 각종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을 인식하여 반영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 2019년도 적자 규모가 2015년, 2017년 예상치보다 올해 예상치가 증가한 것은
· 국민의 의료부담 절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아동 및 필수 의료(중환자실, 응급실 등) 보장 확대, 의료계 적정 수가 보상 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금 기준으로 2019년도 예상 적자 규모는 약 3조2000억 원 수준이며,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는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당시 국민 혜택(보장성)을 확대하면서도 부담(보험료율)이 급격히 증대되지 않도록 기존 쌓여있는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재원계획을 세웠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 현재 예상되고 있는 적자 규모는 당초 수립한 재원 계획 하에서 예상해 온 관리가능한 범위 내의 적자 수준입니다.
 |
| <참고> ’19∼’23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 현금흐름 기준) |
○ 향후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재정누수 관리 강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 관리 목표를 2019년 급여비 1% 절감에서 2023년 3% 절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간 추진해 오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불법 증 대여·도용 관리 등은 더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 이에 더해 ‘제1차 종합계획’ 수립시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의료 과다 이용자 사례 관리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실시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등 ‘새로운 지출 절감 방안’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함께 재정 관리를 강화하여 2023년에도 재정 적립금은 10조 원 이상 유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