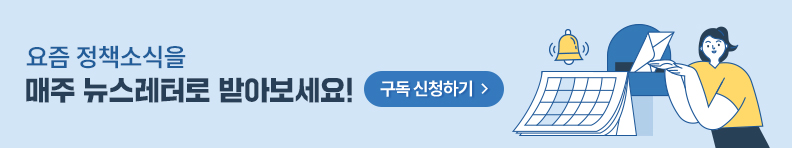콘텐츠 영역
콩나물국밥의 사연
.jpg)
세상 어디든 저마다 사는 방식이 있고 먹는 일도 비슷하다.
같은 나라이니 관공서 양식이며 경찰 제복은 같을지라도 말씨와 차림새며 온갖 습속이 달라서 그 재미로 세상이 굴러간다고까지 생각이 미칠 때가 있다. 왜 아니겠는가. 먹는 일은 더 하다. 비슷한 음식이라 해도 미묘하게 변주가 있다. 이를 테면 중국 화교가 시작한 짜장면과 짬뽕마저도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전국 화교 중국집 연합회라는 게 있어서 대의원대회를 하고 서로 사이좋게 통일해서 만들어 팔자고 굳게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치자. 그래봤자 각자 고향의 주방에 들어서면서 까맣게 잊어버릴 거다. 아니, 설사 그 결의를 지키자고 마음먹었다 해도 별 소용이 없다. 손님들이 이럴 게 뻔하다.
"아휴, 요새 왜 이 집 짜장이 달라진 거 같어. 옛날 같질 않어." 무언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주방장은 뜨끔해서 다시 자신만의 짜장 레시피로 돌아갈 것이다. 음식은 달라야 맛이기도 하니까, 굳이 통일할 필요도 없다. 좌우지간 짜장면 먹고 싶어서 하는 소리다.
콩나물국도 그렇다. 서울 살면서 콩나물국이 '요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식당에서 기본 백반을 시키면 국이 딸려 나온다. 오늘은 무슨 국이 나올까 기대하는 재미로 백반을 오래 먹었다. 하필 콩나물국이 나오면 아주 실망스러웠다. 돈 값도 제일 적고, 미리 끓여두는 국 안에 콩나물은 푹 퍼져 있게 마련이고, 값싼 콩나물 말고 건더기랄 게 없는 이 국의 특성상 별다른 맛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그러다가 전라북도에서 크게 놀랐다. 명성이야 오래 되어서 익히 알았지만 막상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자면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콩나물국밥 정도야 그냥 한 상 주세요, 하면 될 것 같지만 전라북도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다).
수란으로 할까요 날계란으로 할까요, 오징어를 넣을까요 말까요, 밥은 토렴할까요 따로 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어떤 프로그램의 성우 목소리를 떠올리시면 좋다). 가게마다 또 다르고,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르다. 이 동네 사는 친구에게 물었다. 어떻게 먹어야 현지인처럼 쓱, 잘 얻어먹을 수 있냐.
"거, 어렵지 않어. '여기는 어떻게 시켜요?'하고 물어봐" 여기 콩나물국밥은 어떻게 먹어야 좋으냐고 물어보라는 뜻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러면 주인은 아무 말도 없어. 옆에 앉은 아저씨가 대신 말해줄 것이니 그걸 새겨들으면 돼."
아아,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매출 올리고, 아저씨는 나 같은 외지인 안내를 해줘서 뿌듯하고, 나는 제대로 시켜먹어서 좋으니 이런 '일거삼득'이 어디 있는가.

사실, 내가 이 지역 콩나물국밥에 놀란 건 전주 남부시장이 시작이었다. 보통의 국밥 프로세스는 비슷하다. 주문하면 뜨거운 국을 푸고(더러는 밥을 토렴하고) 양념을 얹어 반찬 곁들여 낸다.
헌데 그 시장 국밥집은 달랐다. 시장 밖으로 차가운 새벽공기가 낮게 깔려 있고, 국솥의 김은 여닫는 문 밖으로 느리게 퍼져 나가는 가운데 주문 받은 '이모'가 국을 담은 투가리를 커다란 탁자 위에 척 올린다. 그럼 그걸 받아먹으면 될 것 같지만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다. 마늘과 매운 고추며 파를 냅다 도마 위에 올려서 손님을 마주보고 다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렇게 천천히 밥을 내다가는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하는 영세한 국밥집이 어쩔 것이냐 하고 걱정을 하게 만든다. 그러거나 말거나 다다다다, 다진 양념을 척 그릇에 얹어야 이 멋진 국밥이 완성된다. 마늘이며 고추를 막 다진 것과 미리 썰어둔 것을 얹는 것은 천양지차다. 음식은 향인데, 어떤 게 더 맛있겠는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주는 물론이고 익산, 군산 같은 비슷한 권역의 어느 도시에 가도 콩나물국밥으로 한 가락 하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농을 섞어서 세 집 건너 하나는 콩나물국밥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전날 과음하는 아저씨들도 점차 줄고, 먹잘 게 많은 시대라 예전 같은 인기는 아닐지라도 전북에 가서 콩나물국밥 안 먹고 뭐를 먹을 것인가.
추신: 다른 음식은 몰라도, 잘 하는 콩나물국밥집은 택시기사들에게 함부로 묻지 마시라. 전통의 명가들은 물론 동네마다 워낙 신흥강호가 즐비해서 기사님이 즉답을 못하고 골머리를 앓게 된다. 외지인에게 온정을 베풀려는 장한 마음씨 덕이기도 하지만, 맛있는 콩나물국밥집이 너무 많아서 그럴 것이다.

◆ 박찬일 셰프
셰프로 오래 일하며 음식 재료와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 전국의 노포식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오래 맡아 왔다.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의 저작물을 펴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