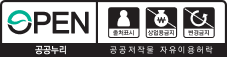폭염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가을엔 왠지 들뜨지 않고 무언가 고적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을 하고 싶어진다. 단풍이 아름다운 산사(山寺)를 떠올려보지만 사실 그곳만큼 북적이는 곳은 없다.
 |
| 권지예 소설가. |
몇 년 전 가을에 나는 한 기업체 사원들과 문학기행 행사의 일환으로 강원도 강릉지역과 평창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일종의 직원들을 위한 연수인데 그들이 작가인 나를 초빙해 강연도 듣고 1박 2일 힐링 여행을 함께하는 이른바 ‘감성연수’ 프로그램이었다. 평창은 좀 낯설다 싶지만 강릉지역은 내가 10년 전에 1년간 머무르던 곳이었다. 그 근방의 대학에 교수로 적을 두고 있어서 서울의 집을 떠나 1년간 아파트를 얻어 살던 곳이다.
동해의 바다에 매료돼 내가 자주 찾은 곳은 삼척과 동해의 경계에 있는 추암 촛대바위였다. 그때만 해도 한적한 어촌인 그곳에 가서 바위에 앉아 파도치는 모습만 마냥 바라봐도 힐링이 되곤 했다. 그동안 그리웠으나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못했다. 연수 프로그램에 동행했던 그해 가을은 집필에 너무 지치고 건강도 좋지 않아 사는 게 이게 뭔가 하고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매사가 짜증이 나고 공연한 불안과 걱정이 마음을 옥죄곤 했다.
다시 그곳에 발걸음을 한 게 10년 만이었다. 바다는 별로 변한 게 없었지만 그 사이 해안을 끼고 도는 삼척에 해양 레일바이크가 생겼다. 레일바이크를 타는 1시간 동안 바다와 해송 숲과 백사장, 기암괴석 지대를 비롯해 해저도시를 연상케 하는 터널지대를 발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레일 위를 달리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사실 내가 강원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연 그대로도 너무나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지방이라는 것이다.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음식도 산해진미가 고루 있으며 인심도 순박하다. 마치 요즘 흔치않은 자연미인을 보는 듯한 풋풋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하면 원시의 미, 그게 또 강원도의 힘인데, 왠지 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보니 강원도도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왠지 살짝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
암흑 속 적막의 순간에 느낀 깨달음
강원도의 자연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어
하지만 그해 가을의 여행에서 나는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깊이 매료됐던 곳은 동강과 백룡동굴이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지금도 이런 길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구불거리며 폭도 좁은 편도 1차선 도로였다.
반대쪽에서 차라도 한 대 오면 난감하겠다 싶었다. 오른쪽으로 동강을 낀 길은 좁게 휘돌아 있어서 버스가 자칫 강에 떨어질듯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기 일쑤였다. 요즘에는 어딜 가나 관광지가 돼 있는 우리나라지만 그곳은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고적하고도 청정한 곳이었다.
동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탐사복과 장화, 헤드랜턴이 부착된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하고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따라가야 했다. 단체로 동굴에 접근하려면 나룻배를 타고 가야 했다. 갱도로 들어가는 광부들처럼 동굴로 들어가니 가을빛이 아름다운 바깥과 달리 동굴 안은 한 점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오래전, 발견되기 전에 동굴 입구는 한 소년의 놀이터였다고 한다. 탐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이 천연동굴에는 박쥐도 살고, 새우도 산다고 한다. 살아 있는 원시 동굴이며, 인공적인 조명이나 계단도 없다.
안전모에 달린 헤드랜턴으로 스스로 발 밑을 밝히며 소위 말하는 개구멍이나 좁은 틈을 오로지 기거나 낮은 포복으로 겨우 몸을 움직여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저기서 안전모가 부딪히는 소리, 야앗!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뚱뚱한 사람이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소리도 들렸다. 이렇게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동굴은 처음이었다. 숨이 차오고 어느새 장화와 탐사복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어느 순간, 탐사객을 모은 가이드가 헤드랜턴을 모두 끄라고 하자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눈을 떠도 절대의 암흑이요, 눈을 감아도 절대의 암흑이었다. 몇 분간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태곳적부터 종유석과 석순이 자라고 있는 이곳의 시간이 아득하게 여겨졌다. 살아 있으면서 절대의 무(無)란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 대신에 어둠은 더 깊은 고요와 더 또렷한 소리를 들려주었다.
한참을 무의 세계에 있으니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노크를 하듯 뇌를 깨우자 오롯이 내 존재감만 이 절체절명의 어둠 속에서 느껴졌다. 한 방울의 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 거대하고 희한한 종유석과 석순을 만들고 키우듯이 어쩌면 내 존재가 한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겸허하고도 확실한 생각이 내 둔한 아집과 감각에 스며들었다. 순간, 세상 잡사와 근심이 먼지처럼 가라앉는 느낌이 왔다.
동굴을 나와서 다시 나룻배를 탔다. 나는 동강의 물을 내려다보았다. 물은 투명한 유리처럼 맑았다. 얼마나 투명한지 강바닥의 모래까지 훤히 보이고 노니는 고기들까지 다 보였다. 게다가 너무 맑은 물이 깊기도 하다 보니 먼 곳의 물빛조차도 햇빛에 빛나는 에메랄드처럼 투명한 초록빛이었다. 동강은 래프팅으로 유명하지만 그곳의 가을 강물은 깊고도 맑고 그윽하기 이를 데 없었다. 투명하고 청명한 가을 햇빛이 물 위에 떨어지니 잔잔한 수면이 유려하고 은은한 광택마저 내뿜었다.
동강을 품은 산들은 단풍이 들어 울긋불긋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투명한 수면 위에 빨간 단풍잎 하나가 일엽편주처럼 흔들리며 떠 있었다. 그 단풍잎도 내 눈에는 보석이 박힌 것처럼 아름다웠다. 루비처럼 빨간 보석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갑자기 왜 그리 빛나고 투명해 보이던지. 어두운 동굴에서 나온 착시 현상과 대비 효과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원도의 자연은 나를 겸허하게 만든다. 때 묻지 않은 자연은 존재의 시원을 생각하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가끔 글이 써지지 않을 때면 동강의 투명한 강물에 머리를 식히고 오고 싶어진다. 사는 일에 지치고, 글 쓰는 일이 허망하고, 풀리지 않는 슬럼프가 닥쳐 용기가 필요할 때는 백룡동굴의 어둠 속에서도 어느 한 순간, 짧지만 강렬했던 그 느낌을 떠올려보곤 한다. 한 방울의 물이 수억 년에 걸쳐 동굴을 만드는데,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물방울의 위로가 들려온다.
글 · 권지예 소설가
[위클리공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