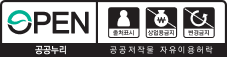“선생님, 제목은 빨간색으로 박아볼까요?”
“제목만 빨간색으로 하면 표지나 헤드밴드랑 톤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글자 가독성도 떨어질 수 있고요. 은박이나 금박도 눈에 안 띌 것 같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공방. 책의 제목을 무슨 색으로 할지를 두고 두 사람은 한참을 고민했다. 표지가 가죽인 경우 책에 제목을 새기는 한 방법으로 콩포스퇴르(Composteur)라 불리는 활자조합기에 알파벳을 끼워 맞춘 뒤 전열기에 달궈 책등에 찍는 것이 있다. 제목에 색을 입히기 위해서는 색박을 입히고 다시 활자조합기로 찍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길게는 수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에 그에 앞서 색깔 하나를 정하는 것도 대충 할 수 없다.
중세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유럽의 전통 제본 방식대로 책을 만드는 예술제본. 대량생산을 위해 기계로 찍어내는 상업제본과 구분하기 위해 예술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당시 유럽에는 성경을 제본하는 수도사(리가토르)들이 따로 있을 만큼 예술제본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었다. 고서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에선 여전히 이 방식이 활용된다.
예술제본 전문 공방 ‘렉또베르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양식 전통 예술제본을 들여온 곳이다. 이곳에선 기존의 책을 분해해 취향대로 크기와 색, 형태 등을 마음대로 디자인해볼 수 있다. 재료와 형태, 만드는 방식에 따라 완성되는 시간은 천차만별. 길게는 책 한 권을 만드는 데 1년까지도 걸린다. 빠르면 하루 만에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역시 일일이 손으로 풀칠을 하고 구멍을 뚫고 꿰매야 하는 수고로운 일이다. 수업을 받고 있던 민주희 씨에게 직접 책을 만드는 이유를 물었다.
“책을 워낙 좋아해서 책을 활용한 취미가 없을까 찾다 예술제본을 알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책을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무척 흥미로웠죠. 작업을 하는 동안은 잡생각이 안 들어 꾸준히 하다 보니 벌써 1년 2개월이나 됐네요. 하지만 아직 가장 좋아하는 책은 작업을 못 했어요.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
|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예술 공방 ‘렉또베르쏘’에서 조효은 대표(왼쪽)와 수강생이 유럽의 전통 방식으로 책을 만들고 있다. |
취향 따라 재료, 색, 크기 등 정할 수 있어
수제본 최대 1년 걸리지만 기계보다 정밀작업 가능
예술제본의 과정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를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단 제본할 책을 낱장으로 분해한 뒤 프레스에 눌러 불어난 종이를 압축한다. 필요에 따라 재단기로 책을 자르고 조합기에 넣어 책등에 톱질을 해 실을 꿸 홈을 낸다. 예술제본에 사용되는 도구는 모두 재래식의 수동형인데 특히 작은 구멍을 내야 하는 톱질은 사람의 손으로 하기엔 너무 정밀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에 대해 이 공방 조효은 대표는 “집중해서 작업하면 오히려 기계보다도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구멍이 생겼다면 수틀에 책을 연결해 한 대수씩 실로 꿰맨다. 대수란 종이가 하나로 붙어 있는 단위를 말하는데 책이 몇 대수로 엮였는지에 따라 실을 꿰는 작업시간이 결정된다. 책등을 둥글게 만들어야 하는 책의 경우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을 한 뒤 책과 판지(완성되기 전 표지의 형태)를 연결한다. 책머리를 장식하는 머리띠는 자신이 원하는 색상으로 실을 꿰면 된다.
마지막으로 표지작업. 표지를 사포로 갈아내는 일은 역시 재질과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가죽의 경우 일주일가량 소요된다. 작업한 표지로 책등을 싸고 면지(겉표지와 본문 사이에 끼는 종이)를 붙이면 끝이다.
얼핏 보면 참 흥미로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함부로 덤빌 취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초급 과정이 약 네 달, 중급 과정을 떼는 데는 2년가량 걸린다. 공방을 차릴 만한 실력이 되려면 적어도 7년은 연마해야 한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예술제본은 책을 정말 좋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
| 1) 수제본을 하려면 수틀에 책을 연결해 일일이 실로 종이를 꿰야 한다. 2) 책의 구조에 따라 책 등을 망치로 둥글리는 작업이 필요할 때도 있다. 3) 예술제본으로 탄생한 책은 만든 이의 취향에 따라 그 모습이 각양각색이다. (사진=동아DB) |
필사한 책·직접 쓴 글 들고 오는 사람도
“수제본의 가장 큰 매력은 한계가 없다는 것”
공방을 찾는 이들은 저마다 소중한 책을 쥐고 있다. 오래 보존해 읽고 싶은 책,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나만 간직하고 싶은 책…. 수년간 쓴 일기나 부모님이 쓴 육아일기, 기존의 책을 직접 필사한 원고나 직접 쓴 원고를 들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자가출판이 대중화되면서 책을 직접 쓰는 것은 물론 그 형태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한편 렉또베르쏘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다. 김중혁, 정유미 등 6명의 소설가가 쓴 작품을 제본이 안 된 원고 상태로 출간해 독자 마음대로 수제본하게 하는 프로젝트다. 같은 원고라도 수제본을 거치면 모두 다른 책이 된다. 100명이 만들면 100개의 다른 책이 탄생하는 게 예술제본의 매력이다. 공방에서 재탄생한 원고는 오는 12월부터 도서관 등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15년째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예술제본의 매력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의 책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저 역시 아직 배울 게 많다고 느껴요. 이는 반대로 말하면 예술제본에는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하는 작업의 가장 큰 매력이죠. 기계로 만들 수 있는 책의 모습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될까 싶은 것까지 직접 손으로 작업해보면 결국 다 돼요. 종이가 책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건 큰 즐거움입니다.”
[위클리공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