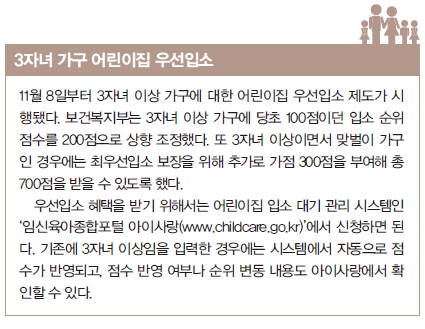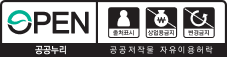“꽃마리~ 우리 오늘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반은 홍련봉공원으로 나들이 갈 거예요.”, “우와, 좋아요!”
할머니댁 마루에 옹기종기 모인 친척 손주들과 고모들처럼 산들어린이집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에는 사랑과 정이 흐르고 있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산들어린이집은 부모가 함께 참여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협동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다. 새하얀 배경에 아기자기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어린이집 벽은 아빠들이 모여 만든 작품 중 하나다.
산들어린이집에서는 교사 휴가 때 일일교사 활동, 1년에 두 차례 의무 교사 활동 등 아마(엄마, 아빠의 줄임말) 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렇듯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공동육아 어린이집 엄마, 아빠들의 의무이자 권리다. 현재 35명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 선생님 모두를 별명으로 부르며 함께 가족같이 평등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한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어린이집의 운영 원칙과 교사 채용, 교육 내용 등 모든 운영을 책임진다. 공동육아의 모태가 된 곳은 1980년대 기부로 만들어진 지역공동체 학교인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해송지역아동센터다.
이후 1994년 서울 신촌에 세워진 ‘우리어린이집’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시초가 됐다. 부모가 조합을 설립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005년 영유아보육법에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 유형 중 하나로 포함됐다.
 |
| 산들어린이집 4세반인 다래머루반 아이들이 꽃마리 선생님과 오늘 나들이 갈 곳을 함께 정하고 있는 모습. |
부모협동 어린이집 전국에 150곳
엄마·아빠·교사 모두 의사 결정 참여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2005년 42곳에서 올해 150곳으로 늘었다. ‘부모협동’이 어린이집의 운영 형식을 규정한 개념이라면 ‘공동육아’는 ‘부모들이 참여해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어린이집의 운영 철학까지 아우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육아 운동을 이끄는 단체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가입된 어린이집(조합형, 구립, 직장공동, 민간)은 지난해 기준 65곳이다.
이 밖에도 현재 공동육아 모델을 기반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방과후교실 18곳, 지역공동체 학교 6곳, 대안초등학교 1곳 등도 설립됐다.
아이들 사이에서 ‘달팽이’로 불리는 산들어린이집 박정화 원장은 “나 혼자는 힘들지만 다 함께라면 어렵지 않다는 것,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육아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공동육아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저희 어린이집은 엄마, 아빠가 모두 조합원으로 함께 꾸려나갑니다. 냉장고 청소, 보일러 고치기 등 사소한 일부터 아이들 급식, 교육, 행사까지 모두 엄마, 아빠가 함께 의사 결정에 참여하죠.”
산들어린이집은 한 달에 한 번 정기 이사회를 갖는다. 특히 교육, 운영, 재정, 시설, 홍보 등 각 분야 이사는 학부모가 맡고, 원장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러한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산들어린이집은 담임교사 1명당 맡는 아동이 4세반 최대 5명, 5세반 8명, 6~7세반이 10명으로 일반 어린이집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선생님들이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 3년에 한 번씩 교사들에게 한 달 유급휴가를 주는 안식월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학부모들이 함께 돈을 모아 제공한다.
 |
| 산들어린이집 박정화 원장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가 가장 이상적인 육아 형태”라며 “품앗이 육아 등 지역 육아 커뮤니티의 정착도 공동육아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
마실 등 단체 활동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이상적 육아 실현
또 생활협동조합에서 구매한 유기농 식재료로 점심식사를 만들고, 주입식 특별활동 대신 전통놀이, 나들이, 요리,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하며 체험형 교육을 실현한다. 도시 환경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신체 성장을 위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연중 일상적으로 바깥나들이를 나간다. 어린이집 안에 CCTV도 없고, 항상 학부모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다.
학부모 임오정(36) 씨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먹거리 선정 등 모든 활동에 부모들이 빠짐없이 참여해 걱정거리가 없다”고 말했다. “저는 5년째 두 아이를 산들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참여해야 할 책임이 많아서 부담도 됐지만, 오히려 내 아이를 우리가 지키고 또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게 든든하더라고요.”
공동육아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임 씨는 “‘마실’이라는 활동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서로의 집을 오가고 대소사를 챙기면서 우리 가족 외에도 많은 가족이 생긴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도 “보통 3세에 들어온 아이들이 7세가 될 때까지 함께 지내다 보니 친형제자매보다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형제가 없는 아이들도 이곳에서 형제 같은 이웃 친구들을 만나니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아빠의 역할도 크다. 1년에 두 차례 의무적으로 일일교사로 참여해야 하고, 또 여성들이 하기 힘든 어린이집 관련 설비나 수리 문제를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한다. 이렇게 자연스레 아이들 보육에 참여하다 보니 아빠들 가운데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커져 대안학교 등으로 전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박 원장은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가 가장 이상적인 육아 형태”라며 “이러한 이상을 잘 실현하려면 공동육아 형태의 어린이집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품앗이 육아 등도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십 년 전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았던 모습이 이제는 보기 힘든데 엄마, 아빠 그리고 지역사회가 힘을 합친다면 다시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위클리공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