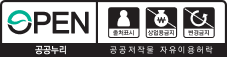“나는 엄마가 좋아
.” “나도 점갑이가 좋아
.” “엄마
, 행복해
? 엄마가 행복하면 점갑이도 행복해
.” 72살 맏딸과
93살 병상의 어머니는 아침마다 둘만의 사랑 노래를 부른다
. 언제나 뽀뽀도 잊지 않는다
. 지난달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최한 ‘내가 쓰는 아빠 엄마 이야기 공모전’에서 여가부장관상을 수상한 황점갑(72) 씨와 그의 어머니의 아침 일상이다
. 그의 자택을 찾아가 두 모녀를 직접 만나보았다
.
집에 들어서자 침상에 누워계신 황 씨 어머니가 눈에 들어온다. 고관절 뼈가 부러진 후 걷질 못하실 뿐 아니라 벌써 몇 해 전 치매 중기 판정을 받았다. 뇌경색과 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년 여 모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잠시 모셨더랬다. 하지만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겨두고 있는 것이 맏딸은 하루도 맘이 편치 않아 다시 모셔왔다.
남편도 “우리 장모님 같은 분 없어. 장모님께 잘해드려.”라며 기꺼이 아내를 보내주었다.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며 둘만의 생활을 시작한 게 벌써 2013년이다. 황 씨는 ‘동생들은 언니도 환자 된다고 반대했는데 내가 너희 마음까지 다 어머니께 전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갈 길 가.’라며 어머니와 둘 만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
| ‘내가 쓰는 아빠 엄마 이야기 공모전’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황점갑(72) 씨와 그의 어머니 박란규(93) 씨. |
평생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으신 어머니셨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고된 농사일에 손이 곱아도 뼈가 부러져도 자식들이 걱정할까 ‘아야’ 소리 한 번 안한 어머니였다. 살면서 병원 가는 것도 아까워하며 자식들만을 위해 사신 어머니!
“세상에 다시없는 엄마에요. 엄마는 골짜기에 파를 심어 50리길을 내다 팔아 나를 공부시키며 키워주셨는데, 엄마는 더 정성으로 길러주셨을텐데 어머니 간병이 뭐가 어렵겠어요. 내 자식에 대한 마음 만분의 일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저 어머니께 받았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그게 두려울 뿐이에요.”라고 황점갑 씨는 말한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그다. 간병인이 일주일도 못하고 관둔 어머니 병수발을 요양보호사 공부도 해서 자격증까지 따며 집에 모셨다. 방 도배도 제 손으로 해드리고 싶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손수 했다.
신문에 난 공모전 기사를 본 동생이 알려줘 참여한 것이 수상까지 하게 됐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표현하고 싶어 응모하게 됐다고 했다. 경사스럽게도 공모전을 알려준 동생도 함께 입상했다.
선비집 딸로 태어난 어머니는 ‘배는 비어도 머리는 채워야 한다.’는 분이셨다. 딸들까지 공부시켜 아들 등골 빼먹는다는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고된 농사일로 뒷바라지 하며 8남매를 모두 도시로 진학시켰다. 그리 바쁜 농번기에도 아들, 딸에게 편지를 잊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께 수시로 예단에 동봉하는 사돈지를 써 달라 부탁했다. 어머니의 솜씨가 아까웠던 여고생 딸은 어머니의 글을 베껴 적어 두었다. 사랑 깊은 부모 밑에서 자란 효심 많은 딸은 50여 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 때 어머니의 글을 간직하고 있었다.
 |
| 어머니가 쓰신 글을 50년도 넘게 보관하고 있는 황점갑 씨. 어머니의 글이 아까워 여고생 시절 어머니의 글을 옮겨적어 두기도 한 그는 어릴때부터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딸이었다. |
평생을 근면하게 사셨던 어머니는 ‘정직해라. 바르게, 알뜰하게 살아라.’를 철칙으로 아셨던 분이다. 일 좀 그만하시라 해도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하겠냐.’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그런 어머니를 꼭 닮은 딸은 “내 몸 하나 편하게 살면 뭐하겠어요.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이 많아서 저도 베풀며 살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인터뷰를 하는 두 어 시간 남짓에도 동네 분들이 황 씨가 나눴던 음식의 보답으로 연신 무언가를 들고 집을 찾아왔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도 있듯 병든 부모님을 수발하는 것은 마음과 달리 참 어려운 일이다. 오래 편찮으신 할머니가 있는 필자는 그래서 황점갑 씨의 어머니 사랑이 실로 위대해 보였다. 힘들고 고된 시기가 왜 없었겠는가! 어머니는 암을 앓으셨고 치매증세로 딸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다. 부모님의 기저귀를 갈아 채우며 하루에도 몇 번씩 목욕을 해드리고, 같이 울며불며 견뎌야했던 시간들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딸의 지극한 간병으로 암은 완치되었고, 정성어린 식이요법과 무엇보다 따뜻한 스킨십, 대화로 어머니의 치매증세도 완화되었다. 따뜻한 손길과 말에는 치유의 힘이 있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온화했던 어머니에게 치매의 보편적인 증세 중 하나인 공격성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항상 어머니를 보듬어주는 딸의 정성과 사랑은 이마저도 극복했다.
“아이같이 웃는 엄마의 얼굴이 좋아서 다리, 허리가 아플 때까지 춤을 춰드려요. 엄마에게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 예뻐요. 우리 엄마 정말 곱지요?” 카메라를 향해 웃어 보이는 두 모녀의 웃음이 가슴 시리도록 참 말갛게 아름답다. 오늘도 황점갑 씨는 어머니가 불안해하실까 꼭 필요한 짧은 외출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어머니 곁을 지킨다.
침상 옆, 어머니의 눈길 닿는 곳엔 평생 금슬 좋은 반려자였던 아버지의 사진과 자녀들의 사진이 놓여있다. 돌아가실 때까지 수첩에 어머니의 사진과 8남매의 사진을 꼭 품고 다니셨던 아버지! 그런 부모를 평생 곁에서 보고 자란 8남매도 참 우애가 깊다. 사진 옆에는 점갑 씨가 붙여 놓은 ‘엄마는 나의 축복’이란 문장이 있다. 어머니는 눈길이 닿을 때마다 그 글귀를 소리 내어 몇 번이고 되뇌신다.
 |
| 평생 금슬 좋았던 부모님은 농사일로 손이 곱아가면서도 8남매를 모두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셨다. |
 |
| 어머니 침상 옆에 붙어있는 아버지 생전과 자녀들 사진. 그리고 ’엄마는 나의 축복’이라 붙여놓은 글귀가 눈에 띈다. 황 씨의 어머니는 눈길이 닿을 때마다 이 글귀를 소리내어 되뇌신다. |
황 씨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저를 정성으로 키우셨듯 이제는 제가 엄마의 엄마가 되고, 엄마는 딸이 되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싶어요. 늙은 부모님을 홀대하는 가슴 아픈 뉴스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라며 애틋한 감정을 담은 말을 건넸다.
인터뷰 내내 코 끝 찡한 순간이 참 많았다. 여기까지 와서 말동무 해줘 고맙다는 황점갑 씨의 따뜻한 포옹을 받고 헤어지며, 한참을 묵직하게 폐부를 건드려대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발걸음이 쉬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했던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되갚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편찮으신 부모를 지극 정성을 다해 모시는 것은 더 어렵다. 병세만으로도 어려운데 그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감정은 환자 뿐 아니라 가족도 지치게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 되기’를 기꺼이 감사하게 실천하고 있는 황점갑 씨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더 감동으로 다가왔다. 부디 앞으로도 두 모녀의 동행이 고단함 대신 따뜻한 날들로 채워지길!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