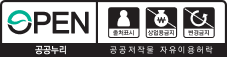지난 달, 한 지역서점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용 경사로 철거명령이 내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다. 시청 측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철거를 지시했다. 경사로는 불과 인도의 1/8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4월 20일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간 장애인 복지정책을 취재한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 정책기자단을 하며 장애인들을 인터뷰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현장에서 취재하며 그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취재를 하며 느꼈던 점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과 정책의 보완도 물론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크게 체감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였다.
한쪽 팔을 사고로 잃은 한 장애인은 직장에서 퇴사 압박을 받고 회사를 떠나야 했으며, 임금을 떼인 일도 있었다. 취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지만 어떤 장애인의 전언에 따르면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관상 장애가 두드러지지 않는 장애인들을 선호한다고 했다.
 |
|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처음 도입한 장애인 재택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사업 교육 현장. |
교통사고로 후천적 장애인이 된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아들의 사고 전에는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보니 우리사회에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일반 교통수단 이용이나 거리 보행에 불편함이 많아 집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음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다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배려와 교육이 부족한 듯하다. 수화동아리 활동을 했던 선배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일화가 있다. 지하철에서 수화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던 선배를 보고 앞에 서 있던 꼬마가 신기한 듯 쳐다보며 엄마에게 물어보자 아이 엄마는 “이런 이상한 사람 쳐다도 보지 마.”라며 욕설을 하고 자리를 옮겼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지가 벌써 십년 전인데 재작년 취재에서 만난 봉사자에게 들었던 얘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지하철을 탔는데 어딜 복잡하게 휠체어를 우르르 끌고 나오냐며 승객이 항의를 했고 이에 한 장애인이 웃으며 “저도 사람이에요.”라고 말하자 그제야 조용해졌단 슬픈 일화였다.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호칭 없이 이들을 비하하거나, 일본에서 쓰는 장해자를 차용해 장애자로 부르던 것이 오랜 논란 끝에 장애인으로 공식적으로 바뀐 것이 불과 1989년이다. 한때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장애우’라고 부르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하는 ‘장애우’라는 표현 대신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장애인이란 표현을 계속 써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현재에 이르렀다.
 |
| 1997년 제17회 장애인의 날 기념 화합의 한마당 개막식.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인다는 목표로 1981년 처음 제정됐다.(사진=공감포토) |
KBS 공채 장애인 아나운서 임세은 씨는 “장애인이 되고나서 예전 같으면 쉬웠을 일에도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들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물리적 제약은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을 불쌍한, 안쓰러운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인식자체가 바뀌었으면 한다. 동등한 사람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것이 사회와 비장애인들에게 바라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
| KBS 공채 장애인 아나운서 임세은 씨. 교통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중도장애인이 된 그는 라켓을 들 힘이 없어 손에 묶은 채 탁구를 친다. 그는 사고 후 오랜 시간 심신의 재활을 거친 후 세상에 다시 나섰다. |
장애인과 함께 사는 방법을 자연스레 배우지 못한 과오가 크다. 얼마 전 버스에서 지적 장애인을 마주친 적이 있다. 혼자 탑승한 스무 살 남짓 장애인의 뜻 모를 행동에 필자를 포함한 승객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만 할 뿐이었다. 어떻게 대처하고 대화를 하면 좋은지 부끄럽게도 일상에서 배운바가 없기 때문이었다. 초-중-고-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과 함께한 일이 드물었다. 따라서 ‘함께’가 아니라 ‘배제’를 도리어 자연스레 체득했다.
필자가 만났던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였다. 우리나라 인구의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인데 이들 중 90%가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하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말이겠지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
| 부끄럽게도 어릴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이웃에서 장애인을 자연스레 만난 것은 손에 꼽혔다. 그러나 정책기자단 활동을 하며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현대인들은 잠재적으로 누구나 장애인이라 하지 않던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 어쩔 수 없이 명명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분법적 틀로 구획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가 있는 유아 자녀의 사진이 기사에 실려도 좋으니 부디 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으면 한다는, 취재현장에서 만난 한 학부모의 절절한 바람이 더욱 와 닿는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큰 도전과 다름없다.
 |
| 국제장애어린이축제에 한 아이가 남긴 편견없는 글귀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준다. |
단순히 배려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을 이해하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장애인이라 차별받지 않고 인간 존엄성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 우리 모두의 한뜻으로 이뤄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생각이 보태진다면 언젠가는 장애아의 교육을 위해 주말부부를 감수하며 셋방을 얻으면서까지 서울로 오는 학부모의 생활도 달라질 것이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에 장애인이 탔을 때 지체된다는 피해의식 대신 자연스러운 시선이 자리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