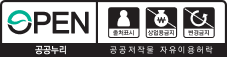저는 서울의 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300명 이상 대기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조업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비교적 일관성 있어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도 좀 덜 받는 편인데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제 친구의 경우는 변화를 좀 더 실감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후 달라진 분위기를 저와 제 친구의 사례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 비교해 보았습니다.
.jpg) |
| 제가 근무하는 제조업체의 근무시간 운영 안내 |
우선, 제가 근무하는 제조업 사례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기 일주일 전 저는 회사 게시판에서 공지사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 40시간 운영원칙’이 공표된 것입니다. 대상은 사무직과 지도직, 특수직, 촉탁/파견직 전부에 해당됐습니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8시간을 근무하되,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사용하는 PC의 전원이 끊기는 ‘피시오프제(PC-Off)’도 8월부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달라진 회사 방침입니다.
.jpg) |
| 시차출퇴근제 주요 내용 |
그중에서 특히 직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시차출퇴근제’였습니다. 예전에도 주말 근무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체휴무를 쓰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눈치가 보였던 게 사실인데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부터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 7월부터 직원들은 개인별로 향후 2주간의 출퇴근 시간과 출장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출퇴근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오후 6시가 되면 퇴근하라는 방송도 나옵니다. 예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된 뒤로는 정시 퇴근이 좀 더 잘 지켜지는 분위기입니다.
.jpg) |
| 합리적 출퇴근을 위한 2주간의 시간계획표 |
그렇다면 서비스업은 어떨까요? 직원수 200명 미만의 미디어 콘텐츠 회사에 근무하는 제 친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수 300명이 안되는 친구의 회사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보 제작과 미디어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는 창의성을 요하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근무시간에 밤낮이 없다고 하네요. 물론 연장근무나 주말근무 시 수당을 받고 대체휴무를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뒤로는 유연근무가 좀 더 확실하게 정착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내에 전자시스템이 구축돼 초과근무를 하거나 개인사정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 곧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건데요. 자신의 근무시간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줘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시간 조절을 해줍니다.
|
.jpg)
|
|
미디어 콘텐츠 회사는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고 제대로 된 보상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었다. |
야근이 일상화된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초과근무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여서 사실 수당이나 대체휴무와 같은 당연한 보상마저 사치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전자결제시스템이 알아서 근무시간을 계산해주니 비로소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다고 친구는 말합니다.
이처럼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듯 보였고,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300명 미만 서비스업이 대규모의 제조사보다 정량적인 근무체계를 더 잘 갖춰나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경호 khpark07@gmail.com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jpg)
.jpg)
.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