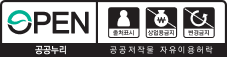중국 탐방 3일째, ‘큰별쌤’ 최태성 강사의 미니 토크콘서트가 있었다. 최태성 강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대한민국이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니. 당연히 한국 아니었던가?
최태성 강사는 중국의 상해(상하이)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난 곳이라는 설명을 이어갔다. 중국 상해를 대표하는 ‘동방명주’ 뒤편에 바로 대한민국이 태어난 곳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다.
 |
| 1926년부터 1932년 5월까지 사용한 상해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 |
당시로 돌아가 보자. 1919년 3.1운동은 우리 민족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황제가 빼앗긴 나라를 국민의 힘으로 찾겠다고 선언한 것이었고, 독립을 위한 염원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준 장이었다.
그 여세를 몰아 일제의 탄압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프랑스 조계지 상해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었다. 마침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발표됐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새로운 우리나라의 시작을 대한민국, 그리고 그 체계를 민주공화제로 선언한 것이다. 그 당시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것은 서양에서도 볼 수 없는 사례였다고 하니 후손으로서 뿌듯함과 뭉클함이 동시에 솟아난다.
그렇게 상해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이 중국 내 고된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넘어갈 즈음엔 27세의 장년이 되어 있었다. 27세까지의 그 발자취를 따라 상해에서 출발을 고했다.
 |
|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입구를 알리는 현판. |
중국 상해시 황포(황푸)구. 신천지라는 쇼핑몰, 그리고 카페 거리가 조성돼 있는 상해 중심부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있다.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웃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오롯이 남아 있다. 누군가의 부엌이 들여다보이고, 빨래가 널리고 상점들이 들어선 그곳에 100년 전의 우리의 역사도 오늘을 채우고 있다.
신천지라는 말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신천지가 열린 곳. 주변의 화려한 건물들과 대비되는 그 공간에 임시정부 청사가 자리해 있다. 주위는 다 재개발된 상황. 이곳 역시 재개발의 바람을 비껴가기 힘들었으나, 청사 터를 보존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또 중국 정부의 협력으로 1993년 청사를 복원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현판이 보이자 가슴 속 묵직한 무언가가 방망이질을 시작한다. 역사의 무게가 묵직하게 전달돼 온다. 상해임시정부청사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좁다란 계단을 끼고 임정 요인들의 집무실과 부엌, 침소 등이 자리하고 있다.
 |
| 상해 임시정부 청사 주변은 여전히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이다. 맞은편으로 신천지라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 있다. |
김구 선생이 한 달 청사 월세 30원을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종종 소송을 당했다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조촐하고 소박하기 그지없다. 세금 낼 국민이 없는, 본국과 떨어진 먼 이국땅의 임시정부였으나 임시정부 요인들은 27년간 우리의 뿌리를 견고히 쌓아나갔다.
5박 6일 내내 함께한 박광일 역사 작가는 “1919년 500년 이상 이어오던 왕조라는 시간의 역사를 버리고, 임정 요인들은 민주정이라는 공간을 채택했다. 독립운동은 민주정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고, 분열의 역사라는 오명으로 불릴지라도 임시정부의 역사는 민주공화정이라는 가치와 민주적인 절차를 굳건하게 지켜내 자산으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
| 김구 선생과 가족들, 임정 요인들이 거주했다고 알려지는 연경방 앞에서 박광일 역사 기행 작가가 설명을 하고 있다. |
김구 선생이 거주했고, 김구 선생의 부인이었던 최준례 여사가 낙상하여 결국 타계에 이르렀다고 알려진 영경방(융칭팡)도 둘러보았다. 임시정부 요인들에게도 이곳에서의 생활은 삶의 연장선이기도 했다. 비록 곤궁하고 일제의 감시망 속에서 독립에 헌신한 나날들이었을지라도. 선생의 거주지를 스쳐 지나며 마음과 머릿속은 한편 더욱 무거워지기도 했다.
다음 날 상해를 떠나기 전, 놓치지 않고 들른 곳이 있다. 송경령(쑹칭링) 능원이다. 송경령은 중국 혁명의 지도자로 불리는 손문(쑨원)의 부인이자 장개석(장제스)의 부인인 송미령(쑹메이링)의 언니이기도 하다. 이 능원 안에 ‘만국공묘’가 있다. 우리 애국선열들이 잠들었던 외국인 공동묘지이다.
 |
| 애국지사들이 잠들었던 상해 만국공묘.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곳에 묻혀있던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었던 박은식 선생과 신규식 선생 등 7명의 유해가 한국으로 옮겨졌다. 애국지사들이 묻혔던 터를 알리는 묘지석은 아직 남아있다. 지난 달 이곳에 잠들었던 애국지사 김태연 선생이 98년 만에 돌아오기도 했다.
불꽃같던 삶이 산화했던 독립운동 투쟁의 현장만이 역사의 전부는 아니다.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영면한 애국지사들의 삶의 결, 그 속에서도 독립운동의 고귀한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다. 새소리 가득한 평온한 아침, 만국공묘에서 삶과 죽음의 무게가 역사의 무게감에 더해 더 큰 크기로 다가왔다.
 |
| 박은식 선생이 계셨던 묘지임을 알려주는 묘지석. |
때로 임시정부의 역사는 누군가에겐 분열로 각인되기도 하고, 이들이 결국 무엇을 남겼냐는 질문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더러 누군가는 ‘실패’라는 낙인을 찍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전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 근간을 27년간 꿋꿋이 만들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임시정부의 존재가치는 차고 넘친다.
5박 6일, 임시정부의 숭고하고 위대했던 그 여정에 보폭을 맞추는 일은 때로는 무겁고도 묵직한 한 걸음을 떼게 하는 것이었다. 그 나머지 이야기가 계속된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