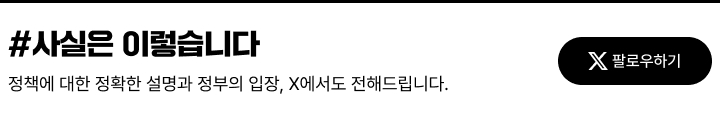기획재정부는 17일자 국민일보 <소득불평등 심해지는데… “나아지는 중” 헛짚은 정부>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지니계수 관련>
기재부는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는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른 객관적 지표로 2011년 이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6년 통계방식 개편(전체가구) 이후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에 따르면 ‘지니계수에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이 누락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지니계수 조사대상 소득에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통해 얻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순자산 지니계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 부재, 자산·부채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 보조지표로만 활용중이고 최근 순자산 지니계수도 개선추세(2011년 0.619→2015년 0.592)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소득 관련>
기재부는 “고소득층의 세금 통계를 볼 때 상위 10%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비중이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근로소득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감소한 반면, 세액비중은 증가해 상위 10%의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5% → 38%, 2012년),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3억원→1.5억원,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2014년) 등에 따라 고소득자 세부담이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재정의 재분배 관련>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소득세 누진도는 높지만 소득세 세수규모가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으며 연금제도 등의 성숙도가 아직 낮고,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 지표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해 소득분배지표 개선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 GDP 대비 소득세 비중(’13년): 우리나라 3.7% / OECD 회원국 8.8%
*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13): (韓)0.336 (日)0.488 (美)0.513 (OECD평균)0.475
이어 “최근 기초연금 도입(2014.7), 맞춤형 급여 개편(2015.7) 등 복지확충과 고소득층 과세 강화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소득분배지표 개선효과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 등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규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09) 59만명 / 4,537억원 (’15) 178만명 / 17,144억원
** 지니계수 개선율(세전·세후 지니계수의 차이 / 세전 지니계수, %)
- (’11) 9.1 (’12) 9.2 (’13) 10.1 (’14) 11.4 (’15) 13.5
기재부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득분배 개선의 근본 해결책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 등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과 맞춤형 급여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지속 추진과 더불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현행 대비 10% 수준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7년 예산안> 생계급여 5.2% 인상, 주거급여 2.5% 인상
* (코스피)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 1%, 15억원(코스닥)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 1%, 15억원
끝으로 기재부는 “향후 연금 수급자 증가, 복지예산 확대및 고소득자 세원파악 확대 등 소득세 과세기반 확충 등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을 통한 소득분배지표 개선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의 : 기재부 정책기획과 (044-215-2810)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