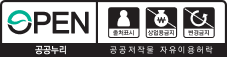독립된 조국으로 돌아가기 전 1945년 11월, 임시정부 요인들은 중국에서의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중경(충칭)에서 마지막 단체사진을 찍었다. 74년이 흐른 후 그들이 섰던 바로 그 계단 앞에 서서 우리는 애국가를 4절까지 합창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구절이 이토록 애달팠던가!
4절까지 부르는 동안 애써 눈물을 꾹꾹 참아냈다. 당시 임정 요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에는 하염없이 짧은 합창이 끝나고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훔치는 손짓들이 보이더니 끝끝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74년의 시간을 초월해 교감의 마음이 이 공간을 통해 강렬히 전해져왔기 때문일 터였다.
 |
| 임시정부 요인들이 1945년 환국 전 마지막 사진을 찍었던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서 우리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 |
21세기의 ‘대한민국’ 속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가 공기마냥 자연스러워 자주 잊고 산다. ‘해방’, ‘독립’ 역사책 속에서나, 사전 속에서나 존재하는 말인 듯했다. 그러나 불과 한 세기 전, 이 두 글자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단 한 번뿐인 삶을 산화한 숱한 생애가 있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그날들이 있었다.
5박 6일 간의 임시정부 현장탐방은 시시각각 그 의미를 불어넣어 주는 시간이었다. 100년 전,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들기 시작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를 채우고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 재개발 중인 아파트촌과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중경 임시정부 청사(연화지). |
먼 이국땅, 한글로 또박또박 적혀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판이 그저 반갑고 고맙다. 중경 임시정부 청사(연화지)는 계속 도시개발 중인 아파트촌과 주택지 사이에 덩그러니 자리해 있다. 까마득하게 올려다 보이는 아파트 사이, 헐려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그 자리에 복원되어 당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이름을 걸고 있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임시정부 시절인 중경 시기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협조 속에 그래도 살림이 좋았던 때였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한 후 중경 청사는 여관, 학교, 주택 등으로 사용되다 1994년 중경시와 협정을 맺고 복원을 시작했다. 현재 이곳 청사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경에 도착하기 전, 우리 일행은 가흥(자싱)과 항주(항저우)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의 거주지를 거쳐 왔다. 정정화 선생은 ‘장강일기’에서 ‘중국에서 손꼽히는 4주를 다 둘러보았는데 가는 곳마다 피난 짐 보따리를 끼고 있어 어디서 먹고 어디서 살고 하는 따위를 따질 겨를도 없이, 나라를 잃고 쫓겨 다니는 몸이라 이름난 고장에 들를 때마다 더욱 가슴이 아팠다’고 적고 있다.
 |
| 가흥에 위치한 임시정부 요인 가족들의 거주지. 이동녕 선생 가족의 방. |
가흥의 임시정부 요인들 거주지는 방으로 나뉘었되 사실상 고스란히 통해 있는 공간을 여러 가족이 나눠썼다. 중국식 나무 탁자 위에 요인들의 가족사진이 한 점씩 놓여 있다. 나라의 독립에 헌신한 투철한 독립운동가였으나 결국 한 사람이었던 생애가 이곳에 남아 있었다.
조국이 무엇인지, 왜 노심초사 도망을 다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고된 나날을 이어가야 했을 누군가들의 삶이 이곳을 스쳐 지나갔다.
 |
| 가흥 시절 임시정부 요인 가족들의 단체 사진. 이동녕, 김구, 이시영 선생들이 보인다. |
중경에서 우리는 폐공장 부지를 찾았다. 이곳 귀퉁이에 ‘한인거주옛터’라고 쓰인 표지석이 놓여 있었다. 중경으로 이동해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가족들이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거주했던 곳이란 설명이 표지석 뒷면에 적혀 있었다.
화상산 한인묘지는 그저 짐작으로 그 흔적만을 찾을 뿐이었다. 임정 요인이던 송병조, 차리석을 비롯해 김구 선생의 어머니인 곽낙원과 장남인 김인 등의 묘지가 있었던 곳이다. 누군가의 삶과 죽음이 새겨지고 잊혔던 흔적 앞에 숙연함이 찾아왔다.
 |
| 중경 한인거주옛터를 알려주는 표지석. |
5박 6일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일정을 뒤로 하고도 마음의 갈급함을 지워낼 수가 없어 마지막 임시정부였던 서울의 경교장을 찾았다. 무수히도 이 근처를 지나다녔으면서도 왜 그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을까? 죄스러움이 앞섰다. 온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통일운동을 이어간 임시정부 요인들의 마지막 투쟁이 경교장에 기록되어 있었다.
 |
|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였던 서울 경교장. |
혼자서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생각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답을 찾아가기도 했다. 30대 직장인인 박혜연 씨는 “그동안 임시정부에 대해 교과서 이상의 지식과 감정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100주년을 맞은 올해 임시정부에 관한 책을 몇 권 읽게 되며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입을 뗐다.
그는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다.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발자취를 책으로 더듬으며 이들의 후손이란 생각이 정말 강해졌다. 내게 임시정부는 ‘희망’이란 두 글자로 정리하고 싶다. 독립된 조국에서 편안히 살아가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위기는 계속 있지 않나. 임시정부의 뜻을 받들어 그런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 그런 희망 말이다” 라고 말했다.
 |
|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가흥으로 옮겼던 김구 선생 피난처. |
20대 대학생 김민주 씨는 “올해 처음 현충원 임정묘역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았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도 처음 갔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오늘을 있게 해준 선열들에게 빚진 마음과 죄책감이 생각보다 컸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근현대사 수업을 신청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게 느껴져서였다”고 전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근현대사는 단지 암기하는 과목에 가까웠다. 그러다 지금은 스스로 선택해 공부하며 조금은 마음으로 역사를 느끼게 된 기분이다. 임시정부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이들이 만들기 위해 노력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기분이랄까? 앞으로 더 공부하고 이분들이 해주신 만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앞선다”고 말을 맺었다.
 |
| 가흥 김구 선생 피난처 앞의 풍경. 선생은 이곳에서 일제 감시를 피해 수로로 이동하곤 했다.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많은 이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역사 속의 과거가 아닌 또 다른 100년의 시작, 그 다짐과 희망의 미래이기도 하다. 이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5박 6일 중국 현장을 돌아봤던 필자에게도 올해의 3월 1일,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은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는 무게감과 책임감으로 다가온다. 더불어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도.
선열들이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숭고한 가치! 공기마냥 자연스러우나 한없이 묵직한 그 존재감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새로이 앞으로의 100년을 써내려가보면 어떨까? 자랑스러운 선열들의 후손으로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