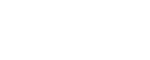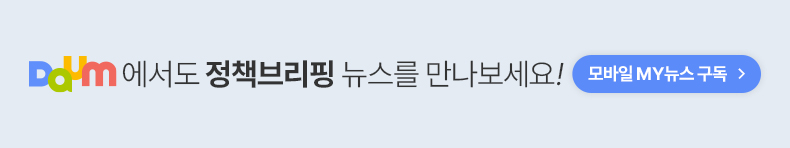-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프랑스 남서쪽에는 인류가 마지막 빙하시대를 살았던 구석기시대 유적인 라스코 동굴이 있다. 이 동굴에는 황소들이 그려져 있는데, 황소그림 주변을 살피다 보면 여러 점들이 표시돼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들은 고대인들이 폴리아데스 성단과 오리온 별자리를 그린 것이다. 폴리아데스 성단이 바로 황소자리에 있는 산개성단이고 오리온자리 또한 황소자리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동굴생활을 하던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은 밤하늘을 보며 별을 상상하고 별자리를 기록했다. 그리고 인류가 의사소통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별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스 신화인 아틀라스와 플레이오네의 일곱 딸 플레이아데스 이야기는 폴리아데스 성단에서 나왔으며, 고대 그리스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도 폴리아데스 성단은 언급되고 있다.
한편 싸움 도중 전갈에 찔려 죽음을 맞이한 포세이돈의 아들 오리온 이야기 또한 그 유래가 별자리다. 전갈자리의 위치와 형상이 오리온 자리를 노리고 있고 서로 상극인 겨울과 여름 하늘에 잘 보이기 때문이다.
즉 별자리 위치에 따라 신화의 스토리들이 생겨났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어쩌면 서양의 별자리 점성술이 오래 전부터 발전해 온 것도 이런 연유이지 않을까 싶다.
우주의 먼 곳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어 서양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 음악적 언어로 변하여 우리 곁에 다가왔다.
고대 그리스 로마신화의 이야기들이 어떤 위대한 작곡가들의 작품소재가 되었을까?

◆ 헨델 : 헤라클레스의 선택, HWV 69
헨델의 오라토리오 <헤라클레스의 선택>은 신화 속 영웅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헤라클레스의 영웅 스토리는 각종 영화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신들의 왕 제우스와 미케네의 왕 엘렉트리온의 딸 알크메네의 아들로 태어난 반신반인 헤라클레스는 그 출생부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헤라클레스 역시 여름철 북쪽하늘에서 볼 수 있는 큰 별자리이기도 하다. 헨델은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오라토리오 형식으로 풀고 있다.
오페라처럼 연기 동작이 없고 주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는 오라토리오지만 작품 <헤라클레스의 선택>에서는 당시 이탈리아 오페라의 영향을 받은 다 카포 아리아(Da capo aria)의 비중이 상당하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합창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국적 오라토리오에 이탈리아 오페라적인 요소가 가미된 작품이라 말 할 수 있겠다.
연주시간만 두 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이 작품의 스토리는 작가 토마스 브루톤(Thomas Broughton)의 대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오비드의 <변신이야기>와 세네카의 <오이타의 헤라클레스>그리고 소포클레스의 <트레키스 여인들> 등의 고대 작품에 상상력을 더하여 대본을 완성하였다.
작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영웅적인 에피소드를 주제로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면에 치중하였다. 공주 이올레(Iole)와의 관계, 아내 데이아네이라(Deianira)의 질투, 그로 인한 영웅의 파국을 그리고 있다.
헨델은 이 작품을 4주만에 완성하였으며 런던왕립극장에서 초연하였다. 초연 이후 작품은 글룩(C.Gluck) 이후 ‘최고의 음악 극작품’, ‘가장 위대한 성취’ 등 극찬을 받았다.
하지만 장르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존재한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 작품을 오라토리오 장르로 분류하지만 성서에 기반한 종교적 작품이 아니어서 애매한 측면도 존재한다.
그래서 헨델 자신도 이 작품을 ‘음악극(A Musical Drama)’이라고 기록 하였으며, 때때로 합창 오페라, 영국 오페라, 신화적 오라토리오 등 다양한 장르로 부르기도 한다.
◆ 베토벤 :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Op. 43
헤라클레스가 12가지 과업을 할 때 아틀라스의 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 신이 있었다. 바로 먼저 생각하는 자인 프로메테우스다.
그의 아우가 나중에 생각하는 자인 에피메테우스인데, 책의 서문을 뜻하는 프롤로그는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맺음말을 뜻하는 에필로그는 에피메테우스로부터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 불을 가져다 주어 제우스로부터 코카서스절벽에 묶이고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제우스의 독수리는 헤라클레스에 의해 제거되고 제우스도 형벌을 풀어주고 소원을 들어주면서 더 이상 신화세계에서 등장하지 않게 된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과 참 가까운 신이다. 프로메테우스가 선물한 불은 인간에게 엄청난 선물이었다.
인류는 불을 다루게 되면서 위협적인 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의 뇌가 발달하고 커진 것 또한 단순한 육식이 아닌 불에 익힌 고기를 먹으면서 발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프로메테우스의 손자인 헬렌은 고대 그리스의 주요부족들인 도리아인, 아카이아인, 이오니아인, 아이올리인으로 퍼져나갔다. 헬렌은 우리 식으로 보자면 단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리스와 오리엔트 문화가 만나 융합된 헬레니즘은 이 헬렌에서 유래된 것이다.
베토벤은 프로메테우스를 소재로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이라는 발레음악을 작곡 하였다. 베토벤과 발레는 어딘지 모르게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는 총 두 개의 발레작품을 남겼고,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은 작품번호가 있는 유일한 발레작품이다.
이 작품은 살바토레 비가노(Salvatore Vigano)라는 이탈리아 무용수와 협력 속에서 탄생되었는데, 작곡가 보케리니(Boccherini)의 조카이기도 한 비가노는 원래 자신의 작품을 직접 작곡하여 공연하는 다재 다능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가의 마리아 테레사 대공비에게 작품을 선보이는 이 공연은 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였고, 그래서 작곡을 베토벤에게 맡긴 것이다.
작품은 전체 2막으로 서곡과 서주, 15개의 섹션과 피날레로 구성되어 있다. 베토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작품의 멜로디는 에로이카 교향곡 등에 차용되었다.
작품은 1801년 비엔나의 부르크극장에서 초연되어 대성공을 거두었으나 현재는 전곡이 아닌 주로 서곡위주로 연주되고 있다. 베토벤이 하프를 사용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참신함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 드뷔시 : 목신의 오후 전주곡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프랑스의 상징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Stephane Mallarme)의 시 <목신(牧神)의 오후>에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이다.
목신은 목동과 초목의 수호신으로 상체는 뿔 달린 사람이고 하체는 염소, 즉 반인반수(半人半獸)이다. 목신은 제우스와 님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기괴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머니 님프로부터 버림 받았다.
그래서 목신은 꿈속에서는 악몽을 불어넣는 존재이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는 공포감을 주어 괴롭히는 신으로 종종 등장한다.
루벤스등 바로크 회화 속에 등장하는 사티로스도 일종의 목신인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판(Pan)으로 불린다. 이는 공포를 뜻하는 패닉(Panic)의 어원으로 하고 있다.
술과 음악의 신 디오니소스의 시종답게 목신 또한 시링크스라는 팬플루트를 가지고 다녔으며 가무를 즐긴 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링크스는 원래 아름다운 님프인데 목신으로부터 피해 다니다 갈대가 되었고, 목신이 그 갈대를 꺾어 악기로 만든 것이다.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 첫마디는 바로 시링크스를 묘사한 플루트의 아름답고 오묘한 소리로 시작된다. 시인 말라르메는 자신의 시와 드뷔시의 음악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며 그의 음악을 높이 칭송했다.
당시 말라르메의 시는 매우 상징적이며 서정적이고 극적인 요소들이 모두 혼합되어 어떤 성향의 시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주류에서는 배척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드뷔시 등 당시 관습적이며 틀에 박힌 예술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예술가들에게는 많은 상상력을 주었다. 주류에 배척당한 목신의 오후 시집 또한 공을 들여 자비로 출판하였는데, 시집의 삽화는 에두아르드 마네가 그려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드뷔시의 작품 또한 초연 당시 애매하고 불명확한 음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 당시 음악은 신고전주의와 후기낭만주의가 주류였는데, 드뷔시의 음악은 조성을 알 수 없고 기존 화성법칙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였기 때문이다.
바그너와 같이 한두 소절만 들어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한 음악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그는 의미의 모호함과 음의 색채화로 감상자에게 상상과 해석의 자유를 던져준 것이다.
이는 말라르메의 시뿐만 아니라 신화가 가진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과도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다. 드뷔시가 작품 제목에 전주곡(Prelude)이라고 붙인 형식 또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 그의 의중이 잘 드러난 대목이다.
전주곡은 첫 악장을 준비하기 전 연주되는 자유로운 기악형식의 곡인데 사실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교향시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듯 드뷔시와 말라르메의 작품은 예술가가 의도한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기존 감상자의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각자 해석의 자유가 더 주어진 감상자라는 측면에서 현대예술의 시작을 알린다고 할 수 있겠다.
☞ 음반추천
헨델의 <헤라클레스의 선택>은 독일의 괴팅겐 헨델 페스티벌을 이끌고 있는 로렌스 커밍스(Laurence Cummings)의 지휘와 괴팅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추천하겠다. 바로크음악의 대가인 존 엘리엇 가디너 경(Sir. John Eliot Gardiner)의 음반도 빼놓을 수 없다.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은 오르페우스 실내 관현악단(Orpheus Chamber Orchestra)이 1987년에 녹음한 음반과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Freiburger Barockorchester)의 연주를 권한다.
마지막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Prelude a l’apres-midi d’un faune)>은 샤를 뒤뜨와 (Charles Dutoit)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오케스라의 연주를 좋아한다. 많은 명연들이 있지만 과하지 않고 서정적인 앙드레 프레빈(Andre Previn)의 연주 또한 섬세하고 훌륭하다.

◆ 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
서울대 음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이 후 Memphis 심포니, Chicago civic오케스트라, Ohio필하모닉 악장 등을 역임하고 London 심포니, Royal Flemisch 심포니 오디션선발 및 국내외 악장, 솔리스트, 챔버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igenartig@naver.com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서 늘봄학교 정착과 향후 과제 다음기사한·일·중 정상회의: 포용외교 개시의 분수령이 되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뒤 환급금이 지급된다.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뒤 환급금이 지급된다.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
카드뉴스
 만화·웹툰 업계 고질병 막는다!…웹툰 50회 연재하면 2회 휴재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가 달라집니다!”
Ⅴ 일주일 중 일하는 날은 평균 5.8일
Ⅴ일평균 창작시간은 9.5시간
- 2023 웹툰실태조사
역대 최대 연매출을 기록하며 거침없이 성장 중인 웹툰 산업.
그 이면엔 열악한 근로상황을 이겨내며 산업을 지탱해 온 창작자들의 노력이 있죠.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안과 신규 제정안이 마련됐습니다.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한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익배분이나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수익배분 규정이 명료해집니다.수익 배분과 방식, 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산 과정은 더 투명해집니다.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마감 일자에 치이는 일정이 반복되면서 연재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적정한 일수의 휴재권을 보장합니다.연재하는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컷 수를 합의합니다.웹툰 연재 시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회차당 최소·최대 컷 분량을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인하고 싶은데…”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상대방에서 설명해야 하고, 15일의 검토기간을 보장해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합니다.
비밀유지 조건을 완화했습니다.계약을 위한 자문, 신고조사 목적의 제공 등 상황에 따라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해요.”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제도를 안내합니다.‘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계약서 조항에 추가했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명시했습니다.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 명시했습니다.
“‘검정고무신’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근 만화·웹툰 원작의 드라마,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계약서 2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앞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계약할 때 사업자와 제3자가 계약할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또는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 환경은 더 안정적으로, 사업화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만화·웹툰 업계 고질병 막는다!…웹툰 50회 연재하면 2회 휴재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가 달라집니다!”
Ⅴ 일주일 중 일하는 날은 평균 5.8일
Ⅴ일평균 창작시간은 9.5시간
- 2023 웹툰실태조사
역대 최대 연매출을 기록하며 거침없이 성장 중인 웹툰 산업.
그 이면엔 열악한 근로상황을 이겨내며 산업을 지탱해 온 창작자들의 노력이 있죠.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안과 신규 제정안이 마련됐습니다.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한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익배분이나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수익배분 규정이 명료해집니다.수익 배분과 방식, 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산 과정은 더 투명해집니다.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마감 일자에 치이는 일정이 반복되면서 연재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적정한 일수의 휴재권을 보장합니다.연재하는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작품 특성을 고려해 컷 수를 합의합니다.웹툰 연재 시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회차당 최소·최대 컷 분량을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인하고 싶은데…”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상대방에서 설명해야 하고, 15일의 검토기간을 보장해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합니다.
비밀유지 조건을 완화했습니다.계약을 위한 자문, 신고조사 목적의 제공 등 상황에 따라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해요.”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제도를 안내합니다.‘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계약서 조항에 추가했습니다.
분쟁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명시했습니다.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 명시했습니다.
“‘검정고무신’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근 만화·웹툰 원작의 드라마,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계약서 2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앞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계약할 때 사업자와 제3자가 계약할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또는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 환경은 더 안정적으로, 사업화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
건강
 Q&A로 알아보는‘백일해’
백일해는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전국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 중이며,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일해에 감염되어 주변 친구, 나이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은 미접종자나, 총 6회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불완전 접종자는 신속하게 접종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의 경우에도 아이와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 백일해 백신(Tdap)의 접종이 필요하다.
* 1세 미만 영아와 밀접한 접촉자(부모, 형제, 조부모, 영아도우미 의료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보육시설 근무자,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
백일해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백일해의 증상은?
A. 백일해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10일(최소 4일~ 최장 21일)이며, 증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발열은 심하지 않다.
· 카타르기(1~2주) : 콧물, 재채기, 가벼운 기침 등
· 경해기(4주 이상) : 매우 심한 기침, 숨을 들이쉴 때 (Whoop) 소리 등· 회복기(2~3주) : 발작성 기침이 서서히 줄면서 2~3주 내 사라짐
Q2.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A.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된다.
Q3.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
Q4. 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
A.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한다.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기 바란다.
Q5.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
A.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하여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Q6.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받았다. 비용 지원이 되나?
A.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이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
Q7.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
A.항생제별 복용 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Q8.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Q9.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탑승 열 포함 앞·뒤 각 2열씩 총 5열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동행자는 탑승 위치에 상관없이 밀접접촉자에 포함되며 역학조사를 통하여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 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Isolation
Q10.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
A.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한다.
*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Q11. 백일해의 예방 수칙은?
A.접종 일정에 맞춘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해야 한다. 또한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는다.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는다.
자료=질병관리청
Q&A로 알아보는‘백일해’
백일해는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전국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 발생 중이며,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일해에 감염되어 주변 친구, 나이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은 미접종자나, 총 6회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불완전 접종자는 신속하게 접종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의 경우에도 아이와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 백일해 백신(Tdap)의 접종이 필요하다.
* 1세 미만 영아와 밀접한 접촉자(부모, 형제, 조부모, 영아도우미 의료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보육시설 근무자,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
백일해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백일해의 증상은?
A. 백일해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10일(최소 4일~ 최장 21일)이며, 증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발열은 심하지 않다.
· 카타르기(1~2주) : 콧물, 재채기, 가벼운 기침 등
· 경해기(4주 이상) : 매우 심한 기침, 숨을 들이쉴 때 (Whoop) 소리 등· 회복기(2~3주) : 발작성 기침이 서서히 줄면서 2~3주 내 사라짐
Q2.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A.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된다.
Q3.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
Q4. 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
A.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한다.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기 바란다.
Q5.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
A.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하여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Q6.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받았다. 비용 지원이 되나?
A.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이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
Q7.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
A.항생제별 복용 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Q8.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Q9.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탑승 열 포함 앞·뒤 각 2열씩 총 5열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동행자는 탑승 위치에 상관없이 밀접접촉자에 포함되며 역학조사를 통하여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 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Isolation
Q10.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
A.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한다.
*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Q11. 백일해의 예방 수칙은?
A.접종 일정에 맞춘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해야 한다. 또한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는다.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는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서울공항 도착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서울공항 도착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원하는 사업에 기부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다. 나 역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나면 뿌듯함을 느끼곤 하는데, 최근에는 꼭 내 주변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잘 입지 않지만 깨끗하게 보관했던 옷을 골라 의류 기부에 참여한 적도 있고, 때때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대학생이고 직장인처럼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물질적인 기부를 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큰 액수의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기부하는 소액의 돈이 도움이나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물질적인 기부에 더 소극적인 자세가 되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이하 사진 출처=고향사랑e음)
그러나 최근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큰 액수의 돈만 기부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활용하는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부자가 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해 기부할 수 있어서 꼭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기부 금액의 일부가 기부 포인트로 적립되는데, 해당 포인트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별로 구성되어 있는 답례품몰에 들어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의 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6월 4일을 기준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 변화는 바로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실행이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대한 설명.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기부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부 방식과는 다르게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역을 지정해 기부해도 내가 기부한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정기부 방식을 통해 기부하면 직접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해당 사업에 돈이 사용되도록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부한 돈의 사용처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실제 기부하기화면.
기부 방식 또한 간단하다. 오프라인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농협에 방문해 기탁서와 기부금을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사이트에 접속해 기부하기를 누른 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를 선택해 원하는 사업에 기부하면 된다.
직접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기부한 사업.
기부에 참여하고 싶었던 나는 어떤 사업에 기부할지 고민하다가 광주광역시 동구의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야구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힘든 시기에 야구를 보며 행복을 느꼈던 기억이 있기에 야구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웃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어서 그런지 기부 후 느끼는 뿌듯함이 배가 되었고, 소액의 기부금이지만 작은 희망들이 모여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또한 생겼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참여 후 확인한 기부 완료 문구와 메시지.
온라인으로 기부하기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나니 기부가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창에 떴고, 문자로도 기부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다. 기부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니 내 고향에 기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야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뿌듯함이 느껴졌다.
혹시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소액이라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기부를 망설이고 있거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라 기부를 꺼려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이용해보길 권한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활성화와 더불어 기부를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원하는 사업에 기부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다. 나 역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나면 뿌듯함을 느끼곤 하는데, 최근에는 꼭 내 주변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잘 입지 않지만 깨끗하게 보관했던 옷을 골라 의류 기부에 참여한 적도 있고, 때때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대학생이고 직장인처럼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물질적인 기부를 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큰 액수의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기부하는 소액의 돈이 도움이나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후부터는 물질적인 기부에 더 소극적인 자세가 되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이하 사진 출처=고향사랑e음)
그러나 최근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큰 액수의 돈만 기부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활용하는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부자가 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해 기부할 수 있어서 꼭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기부 금액의 일부가 기부 포인트로 적립되는데, 해당 포인트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별로 구성되어 있는 답례품몰에 들어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의 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6월 4일을 기준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 변화는 바로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실행이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대한 설명.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기부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부 방식과는 다르게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역을 지정해 기부해도 내가 기부한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정기부 방식을 통해 기부하면 직접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해당 사업에 돈이 사용되도록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부한 돈의 사용처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실제 기부하기화면.
기부 방식 또한 간단하다. 오프라인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농협에 방문해 기탁서와 기부금을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사이트에 접속해 기부하기를 누른 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를 선택해 원하는 사업에 기부하면 된다.
직접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기부한 사업.
기부에 참여하고 싶었던 나는 어떤 사업에 기부할지 고민하다가 광주광역시 동구의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야구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힘든 시기에 야구를 보며 행복을 느꼈던 기억이 있기에 야구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웃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어서 그런지 기부 후 느끼는 뿌듯함이 배가 되었고, 소액의 기부금이지만 작은 희망들이 모여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또한 생겼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참여 후 확인한 기부 완료 문구와 메시지.
온라인으로 기부하기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나니 기부가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창에 떴고, 문자로도 기부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다. 기부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니 내 고향에 기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야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뿌듯함이 느껴졌다.
혹시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소액이라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기부를 망설이고 있거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몰라 기부를 꺼려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이용해보길 권한다.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활성화와 더불어 기부를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어릴 적 갖고 놀던 장난감으로 국가유산을 만든다면?
레고 아티스트 콜린 진의 작품, 레고 오향친제반차도.
레고로 제작한 종묘제례악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는데요, 외국인 관람객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릴 적 갖고 놀던 장난감으로 국가유산을 만든다면?
레고 아티스트 콜린 진의 작품, 레고 오향친제반차도.
레고로 제작한 종묘제례악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는데요, 외국인 관람객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