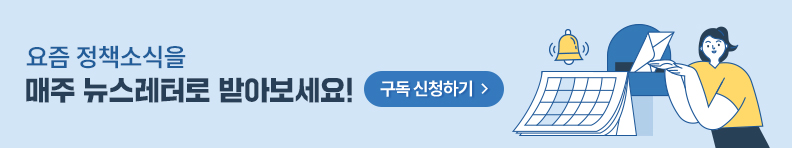콘텐츠 영역
빨간짬뽕, 하얀짬뽕
.jpg)
자칭 내 별명은 '국수주의자'였다. 국수는 물론 '國守'가 아니다. 독자들이 그렇듯 나도 잔치국수, 비빔국수, 쫄면, 라면, 우동, 짜장면, 냉면까지 온갖 면을 먹었다. 밥은 반찬으로 변주하는데 국수는 '가루를 내어 반죽한 후 뽑는다'는 것만 같을 뿐 제면 방식과 가루의 종류, 소스와 국물에따라 너무도 복잡한 스펙트럼이 있다. 이번엔 중국집 면을 다뤄본다.
.jpg)
당신은 혹시 중국집에 갈 때마다 갈등해본 적이 있는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물론 우동과 기스면에게는 미안하지만 대세는 그랬다. 아마도 어려서는 짜장면이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을 것이고 나이 들면 짬뽕이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나도 그랬다. 더러 우동(그것도 곱빼기로)을 먹는 때도 있었다. 이십 대의 일이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좀 삐딱하게 어른 흉내를 내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 무렵에는 아버지를 흉내내어 '기스면'도 자주 먹었다.
기스면을 모르는 분에게 말씀 드리자면, 일종의 미각적 쾌락을 완성하는, 중국집계의 평양냉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짜장면의 기름기 어린 고소함도, 짬뽕의 폭발하는 쾌락도 없는 소박하고 순수하며 다소곳한 국수가 기스면이다. 닭의 살을 섬세하게 썰고 국수도 세련되고 우아하게 가늘고 길다. 국물은 닭 육수로 기름기 없이 단정하게 만든다.
기스면은 한자로 '鷄絲'면이다. 닭을 실처럼 가늘게 썬다는 뜻이다. 산둥방언에다가 한국에서 발음이 적당히 달라진 경우인 듯하다. 중국 원어로는 당연히 '지스'인데 우리나라에 온 화교가 주로 산둥사람들인지라 그들의 방언대로 '기'라고 읽는다고 들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화교는 1882년 임오군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맺은 불평등조약에서 건너오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중국이 자연재해와 정치격변으로 난리가 나고, 한반도에서도 여러 필요에 맞춰 화교를 많이 받아들였다. 그 수가 점차 늘면서 중국집을 열게 되었고, 현재에 이른다. 북한에도 화교가 들어왔고, 그곳에서도 짜장면의 인기는 아주 높다고 한다.
아직도 나는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과거와 달리 짬뽕으로 기울곤 한다. 미안하다 짜장면아. 옛날, 아버지는 짬뽕을 좋아하셨다. 약주하신 다음 날, 주로 일요일에 짬뽕을 시키셨다. 물론 내 몫의 짜장면도. 당시는 토요일이 '반공일'(오전에만 일하는 날)이어서 근무를 했다. 아버지도 일을 나가서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곤 했다. 집에 전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주문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커다란 검은 자전거를 타고 오시던 중국집 아저씨가 생각난다. 짐칸에 나무로 된 배달통이 실려 있었다. 거기엔 면을 넣고, 자전거 핸들에 주렁주렁 짬뽕국물이 든 양은주전자를 걸었다. 면 그릇을 턱 놓고, 주전자를 기울여 국물을 부었다. 비닐 랩이 나오기 전이라 국물을 그릇에 부어서 가져올 수 없었다. 맵고 진한 향이 온 집에 퍼져나가던 시절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다. 80년대의 일이다. 우연히 인천에 갔다. 당시 인천은 꽤 먼 곳이었고, 어린 우리들이 가벼운 돈으로 '여행'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도시였다. 바다가 있었으니까. "아무 일 없이 바다로 가자!"하고 인천행 전철을 탔다. 월미도, 자유공원, 연안부두를 돌았다. 그리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다. 알다시피 인천은 화교가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역사적인 공간이다.
나는 어른 흉내를 낸다고 짬뽕을 주문했는데 '하얀 짬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주문할 때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걸 대충 듣고 그러마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얀 옛날 짬뽕을 먹겠느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다. 알고보니 그 지역은 화교세가 아주 센, 지금의 차이나타운이 가까운 동네였다. 지금 인천역 뒤 부두가 바로 보이는 언덕배기에 있던. 기억에는 그저 볶은 채소에서 고소한 불 기름 향이 나던 것, 그릇이 서울과 달리 아주 작아서 국물이 자작했던 것, 홀에서 잊고 있던 유년기의 '진짜 중국인 가게의 냄새'가 나던 것이 남아 있다. 따뜻한 난로의 탄 냄새도.
요즘은 그런 식의 짬뽕을 '백짬뽕'이라고 부른다. 빨간 짬뽕에 대비되는 작명이다. 아주 오래 전에, 그러니까 1960년대는 짬뽕의 색이 아직 하얗던 시절이었다. 점차 한국인의 기호에 맞춰 짬뽕국물은 주황색으로, 더 나아가 아주 선명한 빨간색으로 바뀌어갔다. 빌로드천 같은 푹신한 쿠션에 겨울이면 좌석 밑 레이디에이터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주던 경인선 전철의 기억도 이제 사라져간다. 그때 중국집은 언젠가 작정하고 가서 찾아봤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화교 중국집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런 가게가 흔했던 인천도 옛날 같지 않다. 그래도 몇몇 집이 아직도 남아 손님을 기다린다. 어린 날의 백짬뽕 맛은 아니겠지만 아직도 그런 짬뽕을 파는 집이 있으리라. 기름이 잘 녹아들어 진하면서도 뽀얀 그 국물맛을 볼 수 있을까.

◆ 박찬일 셰프
셰프로 오래 일하며 음식 재료와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 전국의 노포식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오래 맡아 왔다.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의 저작물을 펴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