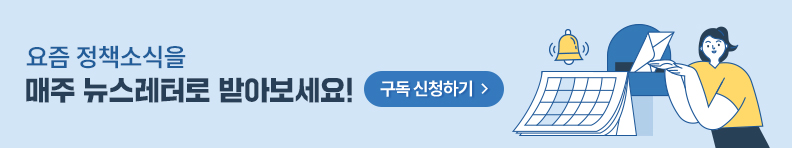콘텐츠 영역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우리를 울렸다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도시의 크리스마스는 축제 분위기였다. 유럽과 미국의 문화가 아시아로 이식되면서 자연스레 따라온 방식이었다. 거리에 캐롤송이 가득하고 트리를 세워두는.
한국이 폐허를 딛고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는 70년대부터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을 들썩이게 하는 축일이었다. 아마도 기부금이 제일 많이 걷히는 구간도 이 무렵이었을 것이다. 번화가에 나가 인파에 치이면서 움직일 때 자선냄비 종소리를 듣는 것도 70년대 도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감각이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굳이 떠올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벅찬 감정이 넘쳐나는 날이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제몫을 다하는 것이었을 테고.
.jpg)
그날이 즐거운 것은 아이들이었다. 많은 집들이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거나 외식을 하기도 했으니까. 우리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생활비가 늘 빠듯해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은 건 어른이 되어서였다. 그 전에는 군고구마와 귤에 가수 혜은이가 선전하는 오렌지과즙음료('써니텐'이라고 아실까 몰라)이나 차범근이 모델인 오렌지주스(정확한 이름 대신 그의 백넘버를 딴 '오렌지 일레븐'이 생각난다)를 마셨다.
군고구마를 굳이 먹은 건 아마도 그 무렵 거리마다 군고구마 굽는 리어카가 많았고, 벌어서 학비 보태려는 고학생 이미지가 있어서 어른들이 한두 봉지씩 팔아주는 문화가 있었던 까닭이었다. 아아, 꼭 그런 착한 고학생만 파는 것도 아니었다. 공부는 전혀 안 하는 날라리 형들이 돈 벌어서 놀려고 한다는 의도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군고구마를 사는 어머니에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다. 나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그 형이 어머니 몰래 눈을 부라리며 나의 폭로를 사전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잘못 보이면 딱지 살 비상금까지도 '삥을 뜯기'거나 군밤을 맞아야 했다. 나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야말로 부활절과 함께 그들 문명권 최대의 축제였다. 나는 젊을 때 잠시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하면서 지냈는데, 그들은 개인 기념일 말고는 보통 일 년에 두 번 케이크를 샀다. 물론 앞서의 두 명절날이었다. 시내 제과점과 골목의 가게마다 산처럼 케이크를 쌓아놓고 있어서, 이방인인 나도 알 수 있었다. 우리 같은 케이크는 아니고, 주로 말린 과일을 넣은 단순한 스폰지케이크였다. 한국의 케이크가 훨씬 더 화려하고 맛있는 편이다.
제과사인 내 친구는 서울의 오래된 제과점에서 사십 년 가까이 케이크를 구웠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케이크 문화사는 케이크 만드는 제과사, 요즘 말로 '파티셰 잔혹사(?)'였다고 한다.
"부활절에는 케이크가 따로 더 팔리는 건 없어. 일 년 기준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딱 세 번이야. 이런 날이 닥치면 달력을 안 봐도 알 수 있어. 그만두는 직원이 생기거든(웃음). 너무 힘드니까 미리 사라지는 거야."
장사가 잘되는 제과점은 심지어 몇 주 전부터 케이크를 구웠다고 한다. 미리미리 만들어서 재고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케이크 굽고 장식하다가 조는 사람도 많았다고.
아, 그 눈물 어린 날들. 제과사는 만들다가 힘들어서 울고 나는 케이크가 먹고 싶어 울고. 그 무렵의 크리스마스 기억이란 동네 '뉴독일제과'와 '독일제과' 진열창에 놓인 케이크 구경이 대단했다. 어머니가 사주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는 수밖에. 그때 진열창은 길가에 쭉 유리를 대고, 그 안에 알록달록한 케이크가 놓여 있는 것이었다. 유리창은 셀로판지로 장식한 가게 상호가 붙여져 있었고. 더러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면 '독일제고'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그 안의 케이크는 아주 멋졌다. 요즘 케이크는 '미니멀'한 게 대세이지만 당시는 누가 더 화려하고 요란하게 장식하느냐 제과사들끼리 경쟁이라도 붙었던 것이 틀림없다. 뉴독일제과에서 크림을 두 겹 리본장식으로 짜올려 붙이면, 라이벌 독일제과에서는 세 겹으로 하는 식이었다.

어느 해인가, 동네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다. 물론 아이들 사이에서. 두 제과점 사장님끼리 멱살잡이를 했다는 것이었다. 대략 누가 누구 케이크 데코(그때는 데코레이션이나 디자인이란 말은 케이크에 쓰지 않았을 것 같다)를 베꼈다는 항의와 싸움이었다고 했다. 이 싸움은 사실 언젠가 한번 터질 만한 것이기도 했다. 뉴독일제과는 독일제과에서 근무하던 제과장이 독립해서 차린 가게였다. 뉴독일제과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일본에 연수를 가서 선진 기술을 배워왔다고 했다. 외국여행이 금지된 시기였지만, 산업연수는 당국에서 비자를 내주었을 것이다.
진짜 일본 연수는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뉴독일제과 진열창 안의 케이크에는 놀랍게도 정교한 모양의 산타할아버지와 트리 장식이 '턱' 얹어져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동네 애들이 죄다 진열창에 코를 박는 일이 생기고도 남았다. 우리들은 두 패로 나뉘어 격렬하게 싸웠다. 저 장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안에 심지어 잼이 들어 있다는 패가 있는가 하면 다른 패는 저건 가짜다, 먹을 수 없는 거라는 논지를 폈다. 그 싸움은 싱겁게 끝났다. 뉴독일제과에 근무하는 형을 둔 아이의 심판이 있었다.
"우리 형이 그러는데 저건 먹는 거래."
그렇게 어느 도시 변두리 아이들에게 케이크는 깊게 각인되었다. 알려두는데, 두 제과점의 이름은 가명이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살을 붙여 쓴 얘기임을 밝힌다. 빈곤을 벗어나 이제는 나도 케이크 하나쯤은 사먹을 수 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며, 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건하고 기쁘게 케이크를 사서 가족과 나누련다.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 박찬일 셰프
셰프로 오래 일하며 음식 재료와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 전국의 노포식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오래 맡아 왔다.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의 저작물을 펴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